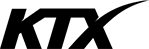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라는 제목으로 익숙한 그 곡을 지휘자 존 엘리엇 가디너는 59분대에 마치고, 오토 클렘퍼러는 80분을 넘겨 연주한다. 같은 악보를 가지고 연주 시간이 20분 이상 차이가 나는 일이 가능한가? 이게 지휘자의 역할이고 권한이다. 악보를 해석하고 실제 음악으로 들려주는 전문가.
지휘자는 악단이 자리 잡은 뒤 마지막에 나와 청중의 박수를 받고, 곡을 끝내고도 박수 속에 가장 먼저 퇴장한다. 공연하는 동안 팔을 저을 뿐, 연주는 연주자의 몫이다. 잘 교육받은 프로 연주자가 모여서 하는 합주에 과연 지휘자가 필요한지 의문이 들 법도 하다.
처음엔 그랬다. 태초에 음악이 있었으나 지휘자는 없었다. 바로크 시대에는 특정 악기 연주자가 곡의 시작을 눈짓‧몸짓으로 알리고, 미리 약속한 빠르기로 연주를 진행했다. 그러다 베토벤이 등장한다. 이전에는 작곡가가 왕족‧귀족의 후원이나 의뢰를 받아 음악을 작곡한 반면, 베토벤은 자신이 쓰고 싶은 음악을 지어 발표하기 시작했다. 음악회에 지갑을 열고자 하는 청중도 생겨났다. 열 명, 스무 명 규모 악단으로는 작곡가의 욕심, 청중의 귀를 만족시키기 어려웠다. 악기 종류와 연주자 숫자가 늘어나고, 곡 또한 길어졌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통상 연주 시간이 15분 내외, 베토벤 바이올린 협주곡이 45분 내외다. 호흡이 긴 곡에서 연주자 100여 명 가운데 누구라도 속도나 셈여림, 들어갈 곳과 멈출 곳을 맞추지 못할 경우 참사가 벌어진다.
자연스레 지휘자 존재가 긴요해졌다. 작곡가가 모든 연주장에 가기란 불가능했고, 마침내는 악보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여리게’ ‘느리게’ ‘부드럽게’라 표기했는지 영원히 알 길이 없다. 작으면 소리가 어느 정도 작아져야 하는지, 휘몰아친다면 얼마나 격정적으로 혹은 어느 악기에 강세를 두고 끌어올려야 하는지 연구하고 구현하는 역할은 지휘자에게 맡겨졌다. 수십 종류 악기로 연주하는 수십 분짜리 곡은 지휘자별로 해석이 천차만별이다. 연주회에서야 손짓‧몸짓만 하지만 그 무대에 오르기까지 지휘자는 누구보다 많은 말을 하고 연주자를 설득하고 의견을 듣는다. 무대 위 ‘조용한 지휘자’는 연습의 결과물인 셈이다.
그렇다고 지휘자가 늘 엄숙하지만은 않다. 가장 유명한 클래식 음악 콘서트인 ‘빈 신년 음악회’가 대표적이다. 힘차게 새해를 맞으라는 의미를 담아 요한 슈트라우스 1세 ‘라데츠키 행진곡’을 앙코르곡으로 택하는데, 2014년 지휘자 바렌보임은 단상을 내려와 악단을 헤집고 돌아다니며 연주자에게 악수를 청해 청중의 웃음을 유발했다. 지휘자가 ‘방해’하는 와중에도 계속되는 완벽한 연주가 무대 뒤편의 피나는 훈련을 증명한다.
유명한 음악은 수만 번, 수십만 번 연주되고 녹음되었지만 하늘 아래 같은 연주는 없다. 지휘자마다, 그와 합을 이루는 오케스트라마다 스타일이 다르니 음악의 세계는 우주만큼 광활하다. 클래식 음악 팬이 특정 곡이나 작곡가 팬에서 시작해 수많은 지휘자를 찾아 나서는 이유다. 악보는 있어도 정답은 없는 매력적인 세계. 그 속을 방랑하면서 내 취향을 발견하는 일은 여느 ‘덕질’이 그렇듯 팍팍한 세상살이의 큰 즐거움이다. 클래식 음악과 친해지고 싶다면 브람스 ‘헝가리 무곡 제5번’ 같은 귀에 익은 곡을 다양한 지휘자 버전으로 들어 보자. 올해는 ‘최애’곡의 ‘최애’ 지휘자 버전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클래식 음악 팬의 새해 덕담이다.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