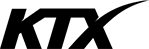때아닌 늦더위가 일으킨 눅눅한 바람이었다. 살갗에 닿는 공기와 달리 구름 몇 점 흐르는 하늘은 청명하다. 맞닿은 두 계절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날, 발 딛고 선 곳은 한반도 남단 하고도 가장 끝자락에 자리한 전남 해남이다. 조선 성종 때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 1946년에 발간한 문답서 <조선상식문답> 등 여러 문헌이 한반도의 출발 지점을 해남으로 삼았다. 대륙으로부터 뻗어 온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고장, 끝과 시작의 경계에서 여정을 펼친다.
두륜산 자연 아래에, 대흥사
해남 삼산면 구림리를 들머리 삼는다. 두륜산 여덟 봉우리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구곡수를 이루고 숲이 우거졌다 하여 붙은 지명이다. 과연 산 아래부터 편백나무, 측백나무가 줄지었다. 숲 사이에 난 계곡을 따라 걸음을 재촉하니 사방이 푸르다. 나무와 꽃이 많아 언제나 녹음이 가득해 봄이 길게 머무른다는 뜻을 가진 장춘숲길에 들어섰다. 포장된 길과 물소리길이라는 표지판을 세운 흙길 시작점에서 고민하다, 계곡을 곁에 둔 물소리길을 선택한다. 1.5킬로미터가량 이어진 길을 느릿느릿 걷는 동안 조르르 물 흐르는 소리와 풀벌레의 합창이 뒤따른다. 이 길로 곧장 오르면 두륜산이 품은 보물, 대흥사와 만난다. 오솔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서정이 가득 차오른다. 봄이 오래 머문다는 길에 어느 계절인들 어울리지 않을까. 봄꽃만큼이나 화려한 단풍으로 물든 길을 상상하던 찰나 부도전이 시야에 들어온다. 승려의 사리를 안치한 탑을 모은 곳인데, 신기할 만큼 개수가 많다. 의문을 해결할 열쇠는 길 끝에 있다.
이따금 땀을 식히는 바람을 반갑게 맞으며 해탈문 근처에 당도했다. 나무가 걷히고 너른 뜰이 드러난 가운데 천년 고찰이 고요하다. “삼재가 미치지 않는 곳이요,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는 땅이다.” 서산대사 휴정이 이곳 대흥사를 두고 남긴 말이다. 임진왜란으로 혼란하던 조선 중기, 황폐해지는 고국과 왜적에게 목숨 잃는 백성을 두고 볼 수 없어 승려가 무기를 들고 나섰다. 서산대사 역시 그중 하나로 승병을 조직해 나라와 백성을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뭇 백성과 승려의 존경을 받던 대사는 입적하며 자신의 의발을 대둔산, 즉 지금의 두륜산에 전하라 했고, 제자들은 그의 유촉을 받들었다. 신라 시대 법흥왕이 통치했던 514년, 헌강왕이 재위하던 895년 등 문헌마다 일컫는 때가 달라 정확한 건립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고려 시대 이전부터 대둔사라는 이름으로 존재한 것은 확실하다. 대흥사는 서산대사 입적 뒤에 13명의 대종사를 배출하는 등 크게 흥해 이름을 바꾼다. 조선 후기, 차를 다루는 다도에 능통하고 정약용과 깊이 교류했다는 초의선사가 머문 일지암도 대흥사에서 맨눈으로 보이니, 두륜산이 품은 보물은 한둘이 아닌 셈이다.
사찰에 깃든 이야기를 되새기며 안으로 든다. 삼존불을 모신 대웅보전, 불심으로 옥을 하나하나 깎아 만든 1000명의 부처가 자리한 천불전, 서산대사를 기리는 표충사…. 500년이 넘는 수령을 자랑하는 연리근 그늘 아래 멈춰 숨을 고른다. 문득 돌이키니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을 본 기억이 없다. “눈치채셨나요? 대흥사는 동서남북에 천관산, 선은산, 달마산, 월출산이 자리해 그들의 몫을 대신합니다. 또 전쟁 속에서도 나라를 보호한 서산대사를 모신 표충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자연과 선조가 대흥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윤영애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시간 버텨 왔다는 것은 숱한 고난에도 변하지 않을 만큼 굳건하다는 의미다. 언제까지나 두륜산 자락을 수호할 곳. 대흥사의 처마와 기둥을, 강인한 그 모습을 눈과 마음으로 쓸었다.
남도의 맛, 해남 산채정식
여행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꼽으라면 단연 음식이다. 찬란한 풍경과 애달픈 이야기도 허기를 이기기는 어렵다. 맛으로는 전국 팔도에서 으뜸이라는 남도에 왔으니 백반 한 상이 더욱 간절하다. 여행의 즐거움을 북돋아 줄 미식을 찾아 길을 되짚어 두륜산 아래로 간다.
김성환·박미순 부부의 35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전주식당’은 늘 해남에서 나고 자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손님상에 낸다. 도시에서 쉬이 볼 수 없는 노각무침, 고춧가루를 가미한 멸치볶음, 파래무침, 애호박볶음 등 정성스러운 반찬에 이어 고사리, 미역, 도라지, 취나물 등을 아낌없이 고명으로 얹은 산채비빔밥이 가운데를 차지한다. 해남 8미 중 하나인 산채정식이 상 위를 꽉 채웠다. 윤기 도는 쌀밥을 턱 털어 넣고, 양념이 잘 섞이도록 비빈 후 크게 한 술 뜬다. 여러 재료가 어우러지다 표고버섯 향이 존재감을 드러낸다. “아따, 반찬도 그렇고 비빔밥 재료들은 손수 농사지어 기른 것들이요. 우리 집 표고버섯은 향긋해서 자꾸 입맛이 당긴당께. 어뗘, 맛있지라?” 식사에 여념 없을 때 김 대표의 정겨운 사투리가 날아든다. 비빔밥이라면 어딜 가도 밀리지 않는다는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진다. 맛깔스러운 비빔밥 한 술에 주인장의 인심, 해남 찹쌀과 멥쌀로 빚은 삼산막걸리까지 곁들이니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해남미남축제가 열리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는 식당 인근과 두륜산도립공원이 한층 북적인다. 산채정식을 포함한 닭 코스 요리, 삼치회, 보리쌈밥, 떡갈비 등 해남 8미가 총출동하는 데다 특산물인 고구마, 쌀, 향토 음식과 지역 전통주를 한자리에서 맛보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눈앞에 놓인 밥상이 축제의 예고편 같아서 덩달아 신이 난다. 시원시원한 인심과 손맛이 담긴 음식이 그리울 적엔, 단풍으로 물든 이곳을 다시 찾게 되리라.
바다가 들려주는 역사, 우수영국민관광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장은 남쪽으로 갈수록 그 매력이 더욱 깊어진다. 바다가 일렁이는 해남 끝자락에는 충무공 이순신이 이룩한 역사가 서렸다. 판옥선 열세 척 으로 왜군을 무찌른 명량대첩의 무대가 바로 해남과 진도를 가르는 좁은 바다다. 충무공이 승리를 거둔 울돌목을 바라보는 위치에 1990년 명량대첩기념공원을 조성하고 탑을 세웠다. 뒤를 이어 3층 규모로 개관한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 전시관에는 명량해협에서 벌어진 전투의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전법을 쉽게 풀어 쓴 데다 판옥선 내부를 재현한 체험 공간과 게임, AR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관람자가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게 한 점이 인상적이다.
과거를 톺아보는 동안 금세 해가 기울었다. 공원 바로 앞 산책로에 들면 얼마 걷지 않아 울돌목 근처에 닿는다. 소금기 어린 바람을 헤치고 만조를 맞이한 바다 가까이 다가간다. 유속이 가장 빠르다는 시간을 훌쩍 넘긴 때였으나, 울돌목 스카이워크 주변의 물살은 여전히 거셌다. 고뇌하는 이순신 동상도 거친 파도에 맞서 바다를 지키고 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다면 국가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란 뜻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란 중 사헌부 지평 현덕승에게 보내는 편지에 적은 글이다. 갑옷이 아닌 관복을 입고, 칼 대신 지도를 든 채 바다를 응시하는 장군의 모습이 어쩐지 처연해 오래도록 머물렀다. 한반도 끝이자 출발점이기도 한 곳. 모든 것이 움트는 지점에 노을이 물든다. 끝과 시작이 또다시 맞물리는 순간이었다.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