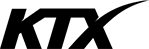호국의 길, 백화산
주홍빛을 머금은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린다. 감나무에는 채 여물지 않은 감이 주렁주렁 달리고 들판은 황금색 물결이 넘실댄다. 투명한 햇살이 곡식과 초목을 어루만지자 따스하고 여유로운 기운이 솟는다. 경북 상주의 가을날, 고장 곳곳에서 느껴지는 풍요로움에 마음이 충만해진다.
여정의 시작점은 상주 서쪽의 백화산으로 정한다. 충청도와 경상도의 경계인 이곳에 숨은 오솔길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다. 백화산 둘레길은 옥동서원을 출발점으로 하여 충북 영동 반야사 터까지 4킬로미터 정도 이어지는데, 이는 상주와 영동을 연결하는 옛길이기도 했다. 산을 가르며 흐르는 구수천을 두고 양옆으로 길이 나뉘어 저마다 보이는 풍경이 다르니 원하는 쪽을 택해 걷는다. 강을 따라가다 무지개다리와 큼직한 돌을 놓은 징검다리를 지나면 본격적인 산길이다. 우거진 숲 아래 흙길이 시원하고 촉촉하다. 나무들이 뜨거운 볕을 막아 주어 산책하기에 쾌적한 환경이다. 이끼 낀 돌 위에서 민달팽이가 뭉그적거리고, 나비가 활기차게 날갯짓을 한다. 다른 생명에게도 상쾌한 것은 마찬가지인가 보다.
출렁다리를 건너다 옆을 바라보자 절경이 눈앞을 가득 채운다.
겹겹이 포개진 산줄기와 윤슬로 반짝거리는 강. 깊은 가을엔 울긋불긋한 색이 더해져 더욱 눈길을 끌겠다.
밤나무골을 지나 중간쯤 오자 출렁다리가 눈에 띈다. 바위산을 배경으로 두고 흐르는 강 위에 놓은 다리라니, 그림 같은 풍경 속으로 뛰어든다. 길이도 80미터로 길지 않아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한다. 울렁거리는 다리를 건너다 잠시 옆을 바라보는데, 순간 절경이 눈앞을 가득 채운다. 겹겹이 포개진 산줄기와 윤슬로 반짝거리는 강. 깊은 가을엔 울긋불긋한 색이 더해져 더욱 눈길을 끌겠다.
산과 강을 동무 삼아 걷는 둘레길의 또 다른 이름은 호국의 길이다. 고려 시대 몽골의 침입으로 혼란할 때, 황령사 승려 홍지가 이끄는 군대가 몽골 장수 차라대의 군사를 전부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승병과 의병이 왜적과 전투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해발 933미터 산 정상에는 신라 무열왕이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진격할 때 쌓은 금돌성과 행궁 터가 남아 있다. 신라와 백제의 경계와 가까웠으니 크고 작은 전투가 잦았을 것이다. 숱한 사연과 역사가 이곳에 얽혔다. 어지러운 사건을 모두 지켜본 산은, 여전히 묵묵하기만 하다.

잔잔한 낙동강, 경천섬
백두대간과 낙동강 사이에 자리한 상주는 비옥한 평야 덕에 예부터 질 좋은 쌀과 곶감으로 명성이 높았다.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수도인 경주 다음가는 제2의 수도 역할을 했다. 고려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는 지명 경상도도 경주와 상주의 앞 글자를 하나씩 딴 것이니, 고장이 지닌 힘이 짐작된다.
상주가 성장한 데에는 낙동강의 몫이 컸다. 낙동강은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시대에는 황산강이라 불렀으나 조선 시대에 이르러 지금 이름으로 바뀐 것이라 추정한다. 조선 시대 지리서 <택리지>는 ‘낙동’, 즉 낙양 혹은 상락의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라 칭했다. 낙양과 상락은 모두 상주의 옛 이름이다. 고장을 끼고 흐르는 강은 거대한 모래톱을 생성했고, 그 규모가 워낙 거대해 강수량이 적을 때에는 모래섬처럼 보이기도 했다. 2011년 상주보를 완공한 후 모래톱이 있던 자리에 생겨난 것이 경천섬이다.
섬이니만큼 차로 진입하기는 어렵다. 누에나방을 형상화한 지붕이 특징인 범월교를 두 다리로 건너 섬에 들어간다. 20만 제곱미터(약 6만 평)에 달하는 생태공원에 한가로운 분위기가 감돈다. 잔디밭에는 띄엄띄엄 소풍 나온 사람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눈다. 나비 모양으로 조성한 길에 코스모스가 한창이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아이와 보호자,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뛰어노는 개까지 모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가을바람을 즐기는 이도 보인다. ‘자전거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고장답게 섬 곳곳에 자전거도로를 표시하고, 입구에 전기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섬 근처에 상주자전거박물관, 상주국제승마장,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낙동강문학관 등이 위치해 문화 여행까지 한 번에 가능하니 심심할 틈이 없다.
입구 반대편, 길이 345미터의 낙강교를 거치면 비봉산에 오르는 길이 나타난다. 그 정상에 낙동강 학전망대가 위치한다. 해발 230미터라 완만하지만 산은 산이다. 가파른 길을 지나 전망대에 도착한 후엔 시름을 잊는다. 낙동강, 경천섬이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광활하기만 한 공원이 이곳에선 아기자기한 장난감처럼 보인다. 구름이 만든 그림자가 산을 덮고, 그 아래 유유히 너른 강이 흐른다. 고려 시대 문인 이규보는 시가 ‘행과낙동강’으로 낙동강에 내린 가을을 노래했다. “청산 속 돌고 돌아서/ 한가로이 낙동강을 지나노라/ … / 가을 물은 청둥오리 머리같이 푸르고/ 새벽하늘은 성성이 핏빛처럼 붉구나.”
하늘이 내린 경천대
경천섬에서 낙동강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면 이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조망한다. 차로 5분가량 이동해 무지산 중턱에 닿는다. 산 위로 향하는 길에 ‘경천대’라고 적힌 거대한 비석이 놓였다. 옛 이름은 하늘이 스스로 내렸다는 뜻의 자천대였다. 조선 시대에 선비 채득기가 병자호란을 피해 이곳에 숨어들었는데, 풍경에 반해 하늘을 떠받친다는 뜻을 담아 새로 지은 이름이 경천대다. 그 광경이 얼마나 빼어나길래 하늘이 내렸다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품었을까. 차오르는 호기심을 품고 전망대로 가는 계단을 밟는다. 나무와 흙으로 조성한 계단 옆에는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톳길을 만들었다. 신을 벗고 피부로 날것 그대로의 자연을 느껴 본다. 몇 그루의 소나무를 지나치자 하얀 옥주봉 전망대가 서서히 드러난다. 아직은 나무에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경천대가 뜸을 들이는 것 같다는 실없는 생각을 하며 단숨에 전망대로 올라선다.
둥글게 흘러 굽이치는 강,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바위 끝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 강 건너에는 황금빛 들판이 드넓다. 마침 벼를 거둬들이는 중인지 빨간 콤바인이 논을 가로지르고, 개미만 한 사람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한다. 가을만이 선사할 수 있는 절경에 탄성이 터진다. 놀라운 사실은 아직 경천대를 다 둘러보지 않았다는 것. 전망대에서 아래로 내려가니 절벽 끝에 위를 향해 솟은 바위를 마주한다. 크고 작은 자갈이 박혀 바위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강 상류의 자갈과 흙이 뒤집혀 생성된 역암이다. 바위 사이에는 명나라와의 의리를 다지자는 문구를 새긴 경천대비가 서 있다. 세월이 흘러 비석도 바위도 조금씩 바랬지만 아직 굳건하다.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