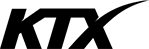윤삼월 하고도 초엿새. 흰 옷을 차려입고 머리에 돌을 인 여인네 한 무리가 열을 맞추어 성곽을 거닌다. 이 신묘하고 아름다운 풍습을 일컬어 성밟기 또는 답성놀이라 했다. 성곽을 세 바퀴 돌고 나면 극락왕생한다는 전설이 수고로운 걸음을 떼게 했을 터. 북망산 저승문이 열린다는 윤달, 성 안팎은 생과 사, 성과 속이 혼재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가을 한낮, 답성놀이 하던 옛 여인의 마음으로 성문 앞에 섰다. 투명한 햇살이 석축에 내려앉아 눈부시게 빛났고, 문루 주위에 늘어선 깃발은 바람결에 춤추듯 나부꼈다. 조선 단종이 즉위한 1453년에 축조한 고창읍성은 오랜 세월 답성놀이 전통을 이어 온 역사적 장소다. 고창읍성만큼 모양성이라는 이름도 널리 사용한다. 이는 백제 때 고창의 지명인 ‘모양부리’에서 온 명칭으로 ‘보리 모(牟)’ 자에 ‘볕 양(陽)’ 자를 쓴다. 풀이하면 ‘보리가 자라고 볕이 잘 드는 고을’. 문득 연둣빛으로 일렁이는 청보리밭 풍광이 스쳤다 사라진다.
모양성제 답성놀이, 걸음걸음에 깃든 진심
고창읍성의 성밟기 놀이는 정유재란 이후 스러진 성벽을 개축하고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 놀이에 참여한 이들은 이승에서나마 극락을 체험하려는 간절한 열망에 달떴다. 이 순간만은 성안이 곧 극락정토요, 입구인 북문과 공북루는 하늘로 올라서는 관문이나 다름없었다. 오늘날 고창군에서는 음력 9월 9일 중양절을 고창 군민의 날로 정하고, 성곽에 깃든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하는 모양성제를 개최한다. 마침 2023년은 제50회 모양성제가 열리는 해이자 고창읍성이 축성 570주년을 맞는 해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고창읍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황홀한 모양성제를 펼칠 것이다.
고창읍성의 품격은 장쾌하고 단단한 자태에 있다. 당대 최신 병법과 축성 기술을 적용해 동쪽, 서쪽, 북쪽에 세 문과 여섯 개 치성을 쌓았는데, 성문은 적을 최전선에서 저지하는 견고한 옹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둘레 1684미터, 면적 16만여 제곱미터(약 5만 평) 규모의 성을 완성하는 데에는 3년이 걸렸다. 조선 시대 호남 내륙을 수호한 전초기지이니만큼 전라우도 고창, 무장, 흥덕, 군산 등지와 전라좌도인 진안, 임실, 순창 등 총 19개 군현에서 온 인부들이 힘을 모았다. 성벽 한편에 작업자의 출신과 축성 연도, 감독자 이름 등을 각자(刻字)해 놓아 이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옹성에 적힌 글씨 중엔 당시 전라우도에 속한 지역인 ‘濟州(제주)’도 있다.
성벽은 큰 돌 위에 작은 돌을 괴어 축조했다. 얽어 놓은 돌이 겨우내 얼었다가 날이 풀려서 갑자기 허물어지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석성 윗부분을 지르밟아 다지는 작업이 필요했다. 앞서 이야기한 답성놀이가 바로 여기서 파생한 습속이다. 마을 여인들은 걸음에 더 큰 무게를 싣고자 기꺼이 돌을 들고 나섰다. 녹록지 않은 일이었으므로 기운을 북돋우는 메시지가 필요했다. 한 바퀴 돌면 다리 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는 이야기가 이 시기에 널리 퍼져 나갔을 것이다.


고창읍성 일원에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50회 고창 모양성제가 열린다. 답성놀이와 강강술래, 성황제와 농악 한마당에 이어 흥미진진한 공연도 마련한다. 포르테나, SG워너비, 손태진, 다이나믹 듀오, 크라잉넛, 심수봉, 설운도 등 출연진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를 펼친다. 문의 063-560-2949(고창 모양성제)

고창읍성 일원에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50회 고창 모양성제가 열린다. 답성놀이와 강강술래, 성황제와 농악 한마당에 이어 흥미진진한 공연도 마련한다. 포르테나, SG워너비, 손태진, 다이나믹 듀오, 크라잉넛, 심수봉, 설운도 등 출연진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를 펼친다. 문의 063-560-2949(고창 모양성제)
가을 한낮, 답성놀이 하던 옛 여인의 마음으로 성문 앞에 선다.
투명한 햇살이 석축에 내려앉아 눈부시게 빛나고, 문루 주위에 늘어선 깃발은 바람결에 춤추듯 나부낀다.
솔숲 너머 대숲, 성안에 고인 시간
북문과 동문과 서문, 그 사이사이에 자리한 여섯 개 치성을 차례로 거닐었다. 쉬엄쉬엄 걸었는데도 눈 깜짝할 새 다시 북문. 순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남짓이다. 그새 다리 병이 나은 걸까, 발끝이 가뿐하고 온몸에 활기가 돈다.
마냥 성곽 길만 따라가기엔 가을볕이 제법 뜨거워서, 성문과 치성을 넘나들며 다시 한번 성 안팎을 누비기로 했다. 동북치에서 동문까지 이어진 성곽에 서서 방장산 자락을 마주하고, 동치와 동남치 사이 구간에선 노동저수지의 호젓한 풍경과 나란히 걷다가, 동남치에서 객사로 난 오솔길에 접어들어 성황사와 맹종죽림에 다다르는 코스다.
성 밖에선 이렇게나 드넓은 대숲이 있으리라곤 감히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1938년 청월선사가 성안에 보안사라는 절을 세우고 주변에 맹종죽을 심기 시작한 게 지금에 이른다. 그야말로 우후죽순. 하늘을 다 가릴 만큼 높다랗게 자라난 대나무가 무성한 숲을 이룬다. 운치가 남다른 까닭에 <왕의 남자> <최종 병기 활>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 <군주> 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무대로 등장하기도 했다. 수묵담채화처럼 청신한 대숲에 안겨 잠시나마 초현실적인 평화를 누린다. 미풍에 댓잎이 흔들리는 소리, 물기 어린 숲 내음, 부드러운 흙의 온기에 속세의 시름마저 잊는다.
동헌과 내아, 장청 뒤꼍으로 이어지는 소나무 숲길도 고아하기가 그지없다. 늘어선 소나무가 저마다 수려하지만, 용틀임하듯 가지를 펼친 두 그루는 각별히 아름다워 할머니, 할아버지 나무라고 부른단다. 두 어르신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생각한다. 600년 동안 한곳에 뿌리내리고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저 버티고 서 있기도 쉽지 않은 세상, 우리를 굽어살피는 모든 나무 어르신께 깊은 존경을 표한다.
단청이 고운 객사와 풍화루부터 북문 옹성을 돌아 나오는 길목에 자리한 비석군까지.
성 안팎에 고창의 역사가 스미지 않은 곳이 없다.


판소리 여섯 마당을 정리하고 명창 진채선을 발굴한, 고창을 대표하는 예술가 동리 신재효를 기리는 공간이 고창읍성 입구에 모여 있다. 고창판소리박물관과 신재효 고택, 신재효판소리공원, 동리국악당과 판소리전수관 등을 두루 살펴본다. 문의 063-560-8061(고창판소리박물관)

판소리 여섯 마당을 정리하고 명창 진채선을 발굴한, 고창을 대표하는 예술가 동리 신재효를 기리는 공간이 고창읍성 입구에 모여 있다. 고창판소리박물관과 신재효 고택, 신재효판소리공원, 동리국악당과 판소리전수관 등을 두루 살펴본다. 문의 063-560-8061(고창판소리박물관)
성을 나서며
소나무에서 단풍나무, 다시 동백나무로 바뀌는 가로수를 구경하느라 발바닥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걸었다. 단청이 고운 객사와 풍화루, 한때 고창여자고등학교가 자리했던 작청 옆 빈터, 고을을 평안하게 다스리라는 뜻으로 현판에 ‘평근당’이란 글자를 써 넣은 동헌, 3·1 만세 운동 터와 흥선대원군 척화비, 북문 옹성을 돌아 나오는 길목에 자리한 비석군까지. 성 안팎으로 고창의 역사가 스미지 않은 곳이 없었다.
고창읍성에 머문 물리적 시간은 반나절도 채 안 되지만, 보고 듣고 만진 시간은 천년에 가까울 것이다. 밀도 높은 시간 여행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해는 중천에 걸렸으니, 다시 새로운 여정을 계획해 보려 한다. 우선 선운사 꽃무릇을 보고, 저녁엔 풍천장어에 복분자주 한잔 기울이며 오늘을 곱씹어야겠다. 마침 불어오는 바람이 달콤하다.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