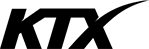전통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에도 시대는 흐른다. 활활 타오르다 갑작스레 식는 온갖 유행의 틈새에서 전통을 전통이게 하는 일은 만만하지 않은 것이다. 글렌모렌지 증류소의 위스키 거장 빌 럼스던은 말했다. “1970년대 스코틀랜드의 바에서 싱글 몰트위스키로 칵테일을 만들어 달라 했다면, 바텐더는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운이 나쁜 경우엔 쫓겨났겠죠. 지금은 그런 바텐더는 없어요. 위스키를 어떻게 즐기느냐, 그건 각자의 몫인 시대가 됐거든요.” 당시 스코틀랜드에서 그런 해프닝이 진짜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위스키를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난롯가에 둘러앉아 마시는 술로 여겼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힘들다. 무엇도 가미하지 않은 채, 한 모금 마시고 길게 음미하는 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달라진 것도 있다. 부르는 게 값인 최고급 위스키에 몇천 원짜리 탄산수를 넣어 하이볼로 즐긴들 아무도 내쫓지 않는다. 시대는 이렇게 흐르고, 전통을 지키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글렌모렌지 증류소는 1843년에 운영을 시작했다. 그리고 18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가장 많이 팔리는 싱글 몰트위스키 중 하나다. 전통과 현재가 조화롭다는 표현이 고리타분하다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글렌모렌지를 소개한다.
줄기찬 도전과 놀라운 성취
1843년, 농부 윌리엄 매더슨이 스코틀랜드 북쪽 하일랜드의 작은 마을 테인에 위스키 증류소를 설립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공식 연도이고, 18세기엔 맥주 양조장이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위스키 역사를 뒤바꾼 이야기의 발단이 다름 아닌 업종 변경이었던 셈이다.
훗날 ‘테인의 장인’으로 불리는 소수 인원이 목이 기묘하리만치 긴(5.14미터) 증류기에서 위스키를 생산했다. 증류주의 하나인 진을 주조할 때 쓴 증류기를 위스키에 적용한 이 도전은 대성공을 거둔다. 위스키 원액이 더없이 맑아져 글렌모렌지 고유의 맛과 향을 일궜기 때문이다. 정오 무렵마다 점심에 곁들일 위스키를 구하려는 인파가 증류소로 몰려들었다. 명성은 스코틀랜드를 넘어 세계로 빠르게 번져 갔다. 유럽, 북미 등에 주재하는 영국 대사관 직원들이 경쟁하듯 글렌모렌지를 구매했다. 물량이 부족해지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본사를 둔 주류 회사가 20세기 초반에 증류소를 인수해 대량 공급 체계를 완성한다. 현재에도 스코틀랜드에서 제일 긴 증류기는 글렌모렌지의 혁신과 전통을 나타내는 첫 번째 사례다.
20세기 초반은 위스키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암흑기였다. 미국이 금주법을 시행한 데다 대공황이 세계를 휩쓸면서 위스키 소비량은 끔찍할 정도로 감소했다. 글렌모렌지 증류소 역시 날벼락 같은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 1930년대에 사실상 문을 닫아야 했고,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연료와 보리가 모자라 생산량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무대에서 퇴장하거나 살아남거나, 글렌모렌지는 갈림길에 섰다. 혁신, 다시 혁신. 스코틀랜드에서 처음으로 미국 버번위스키 오크통을 수입해 사용했으며, 숙성한 위스키를 와인 오크통에서 추가 숙성하는 우드 피니시 양조법을 최초로 시도했다. 물로 희석하지 않은 캐스크 스트렝스 제품도 글렌모렌지가 처음 출시했다.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아도 될 만큼 대중화된, 이젠 위스키 업계에서 전통이 된 주조 기술들이 글렌모렌지에서 비롯했다.
증류기 도입에 이은 혁신과 전통의 사례를 두 번째, 세 번째로 줄짓는 일은 무의미하다. 글렌모렌지는 오래전에 그것의 상징이 되었다.
그래도 굳이 말을 보태서, 글렌모렌지의 맛과 향을 논해 본다. 버번위스키 오크통 숙성 ‘오리지널’, 올로로소 셰리 와인 캐스크 추가 숙성 ‘라산타’, 포트 와인 캐스크 추가 숙성 ‘퀸타루반’, 소테른 와인 캐스크 추가 숙성 ‘넥타도르’. 또 있다. ‘시그넷’은 앞서 언급한 빌 럼스던이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커피에서 영감을 얻어 창조한 제품이다. 감귤과 복숭아의 매혹적인 향기, 초콜릿을 살살 녹여 먹는 듯 달금한 맛, 진하게 밀려드는 향신료와 커피의 풍미. 각각 다른 브랜드의 맛과 향을 나열한 것이지만, 이게 전부 글렌모렌지다. 하나하나 빛나기에 모두 모여 눈부신 글렌모렌지 브랜드는 다 마셔 보길 권한다. 그렇다면 알것이다. 전통과 현재가 조화롭다는 표현이 고리타분하지 않은 위스키를 마침내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곧 만나게 될 위스키의 미래
빌 럼스던은 효모 작용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학자이자 ‘스카치위스키 업계의 별난 과학자’라 일컬어지는 괴짜다. 스카치위스키 아드벡의 제조 책임자이기도 한 그는 2011년, 미세 중력 환경에서 숙성 과정을 연구하겠다며 아드벡 원액을 우주로 보냈다. 누구도 상상해 보지 않은 시도는 글렌모렌지에서도 계속된다. 빌 럼스던은 지난해 ‘엑스 바이 글렌모렌지’를 개발했다. 싱글 몰트를 저마다 취향에 따라 칵테일로 즐길 순 있어도, 칵테일 믹스 전용 싱글 몰트를 전면에 내세운 위스키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 이토록 낯선 영역에 도전하고자 그는 유명 바텐더들을 끌어와 함께 연구를 거듭했다. 그렇게 출시한 엑스 바이 글렌모렌지에 마니아의 찬사가 쏟아졌다. 일반인에겐 생소하겠지만 이 도전은 머지않아 전통이 될지 모른다. 편안하게 바에 앉아 엑스 바이 글렌모렌지로 빚은 칵테일을 홀짝이면서 혁신과 전통을 음미해 보자. 한 모금 마시고 길게, 아주아주 오래도록. 느껴지는가? 위스키의 미래가 또 한 번 현실이 되어 가고 있음을.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