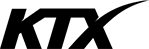110101-100001.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등록번호다. 1968년 11월 21일, 당시 대통령이 1번으로 발급받고 언론에 이를 공개했다. 11은 서울, 01은 종로구, 01은 자하동, 뒤쪽의 1은 남성을 의미하며, 나머지 숫자는 발급 순서 번호였다. 전 국민에게 개인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하기 위해 1968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다.이전에도 신분증 제도는 존재했다. 고려 말에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수입했고, 조선 초 태종이 실시하려 시도했다. 국가가 군역과 세금을 부과하려면 정확한 호구 파악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16세 이상 남성은 이름과 출생연도를 표기한 호패를 착용하게 했으나 양인의 반발이 커 시행이 지지부진했고, 강력한 왕권을 지닌 숙종 대에야 정착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 약 300년이나 걸릴 만큼 신상 일괄 등록이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제도였다는 뜻이다.
1968년 1월 21일 간첩이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분위기가 반전된다. 정부는 간첩 색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를 시급하고도 확실한 대비책으로 추진했다. 이듬해 2만 3000여 종 민원서류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난을 만들고, 여관 투숙처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쓰게 해 주민등록번호는 금세 자리를 잡는다. 불과 3년 사이의 변화였다.
오늘날 익숙한 열세 자리 번호는 1975년 도입했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앞쪽 여섯 자리는 생년월일, 뒤쪽은 성별과 출신지를 뜻한다. 번호 하나에 많은 정보를 담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찮다. 한 고용주가 직원 채용 공고에 “주민번호 8~9번째 숫자가 ○○~○○인 분은 지원하지 마세요”라고 지역 차별을 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지역 번호가 44인 세종시에서는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여자아이 주민번호에 ‘4444’가 연속해서 들어가 고쳐 달라고 국가에 요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주민등록번호를 국가가 발급하지만 개인이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발생한 유출 건수가 억 단위를 훌쩍 넘어 ‘내 주민번호는 공공 정보’라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닐 정도다.
2017년 주민번호변경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번호를 바꾸는 길이 열렸다. 지난 6월부터는 일회성 QR코드로 신분을 확인해 주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나를 구별하는 열세 자리 숫자, 위·변조와 유출 위험이 큰 숫자. 다시 옛날 신문을 읽는다. 1968년 9월 13일 자 신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주민등록은 그 시행의 수단이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본권 보장과 너무나 거리가 있다.” 참고할 만한 대안은 이미 여러 곳에서 제시하고 있다.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