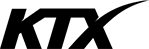1986년 어느 봄, 98세의 가냘픈 노인이 영면에 든다. 누구보다 자연을 흠모한 예술가였던 그의 유골은 미국 뉴멕시코주 샌타페이의 세로페더널 언덕 정상에 흩뿌려진다. 세로페더널을 품은 서부의 광막한 풍경은 그에게 정념의 원천이자 미적 이상향이었다. 그렇게 그는 바람이, 자연이 됐다.
황량한 대지, 사막, 동물 뼈, 나뭇가지에 깃든 아름다움을 화폭에 옮기며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했던 노인이 젊은 시절 각별히 사랑한 대상은 꽃이었다. 세간에선 그의 거대한 꽃 그림을 보고 관능과 에로티시즘을 논했지만, 그는 그저 “꽃이 아름답기에 크게 그렸을 뿐”이라 응수했다. 꽃잎과 꽃잎 사이를 가르는 검푸른 심연을 들여다볼 줄 몰랐으니, 오해와 오독의 세월은 질기고도 길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에게 온갖 환상과 추문이 악귀처럼 따라붙는 시대였다. 1887년 11월 15일 미국 위스콘신의 농가에서 조지아 토토 오키프가 태어났다. 조지아라는 이름은 어머니 쪽 할아버지인 조지 빅터 토토에게서 왔다. 예술가가 되겠다고 공언한 열 살 소녀는 지역 수채화가에게 미술 교습을 받았다. 열여덟이 된 해인 1905년엔 시카고 미술학교에서 수학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이후 뉴욕으로 건너가 아트 스튜던츠 리그에 다녔고, 자주 화랑을 드나들었다. 갤러리 291도 그중 하나였다. 사진가 앨프리드 스티글리츠가 운영한 갤러리 291은 미국과 유럽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모여든 뉴욕 사교계의 사랑방이었다.
스티글리츠라는 이름이 오키프의 생에 난입한 것은 그로부터 약 10년이 흐른 뒤였다. 아버지의 병환으로 돈이 모자라 학업을 중단하고 상업 일러스트를 그리다가, 미술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막 교편을 잡은 즈음이었다. 1916년, 오키프는 동료 아티스트이자 여성참정권론자인 애니타 폴리처에게 목탄 드로잉 몇 점을 보낸다. 이 작품들은 다시 스티글리츠의 갤러리 291에 전달됐고, 오키프의 그림과 처음 만난 스티글리츠는 “아주 오랜만에 발견한 순수하고, 섬세하고, 신실한 물건”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그해 봄 오키프의 작품 열 점이 갤러리 291에 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예술가는 사랑에 빠진다. 스물네 살의 나이 차만큼 권력의 기울기도 컸다. 스티글리츠가 업계 거물이라면 오키프는 그의 어린 연인이자 뮤즈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스티글리츠는 오키프에게 재정 지원과 예술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 커리어까지 쥐락펴락했다. 예컨대, 수채화가 아마추어 여성 화가의 전유물이라고 여긴 스티글리츠는 오키프의 실험적인 수채화 작업을 완강히 저지했다. 그러곤 자신의 ‘크루’인 폴 스트랜드나 에드워드 스타이컨 같은 명망 있는 사진가 친구들과 어울리도록 독려했다. 무엇보다 스티글리츠는 1937년 사진가로서 은퇴하기까지 수차례 오키프의 누드 사진을 촬영했다. 오키프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스티글리츠가 찍은 나를 볼 때, 이 사람이 정녕 누구인지 의아했다. 이건 내가 살았던 수많은 나의 생 중 하나일 뿐이다.”
오키프가 세상에 이름을 드날리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그는 이때부터 대담한 색과 미묘한 표현을 동원한 200여 점의 꽃 그림을 그려 낸다. 사물의 일부를 선택, 소거,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진짜 의미하는 바를 드러낼 수 있다고 믿은 오키프는 꽃 또한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해석했다. 화폭 가득 넘실거리는 백합, 장미, 수선화, 데이지, 양귀비의 조형적 아름다움은 보는 이를 황홀경에 빠트렸다. 뉴욕 셸턴 호텔에 머문 시절엔 뉴욕의 유려한 스카이라인과 마천루를 담은 수많은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사랑은 짧았고 예술은 길었다. 1927년 스티글리츠는 오키프를 저버리고 동료 사진가 도로시 노먼과 열애를 시작한다. 오키프는 한동안 붓을 쥘 수 없었다. 1949년, 뉴멕시코 고스트랜치로 이주하면서부터 오롯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현하기 시작한 그는 마술적이고 원초적인 힘이 느껴지는 풍경화를 그렸다. 사막의 색을 추출한 듯 상아색, 짙은 노란색, 채도 높은 푸른색과 붉은색이 교차하는 그의 그림에선 모래, 흙, 바람, 마른 풀 냄새가 풍긴다.
자연 속에서 비로소 안식처를 찾은 오키프는 멀리 어른거리는 세로페더널의 능선을 바라보면서, 오래도록 충만한 삶을 살았다. 많은 이가 짐작하는 것과 달리 그의 삶은 불행하지 않았다. 스스로 행복을 일군, 진취적인 예술가의 생애였다.
그는 그저 “꽃이 아름답기에 크게 그렸을 뿐”이라 응수했다.
꽃잎과 꽃잎 사이를 가르는 검푸른 심연을 들여다볼 줄 몰랐으니,
오해와 오독의 세월은 질기고도 길었다.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