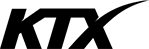만년필
김언
선물 받은 만년필을 잃어버렸다.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인다. 방에서도 안 보이고 집에서도 안 보이고 누구의 집에서도 안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길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누군가의 호주머니 속에 있거나 침대 밑에 있는 것일까? 그것은 쓰레기로 쌓아 올린 어떤 산더미에 묻혀 있는 것일까? 선물 받은 만년필이 안 보인다. 지금까지는 잃어버린 것이 분명한 만년필은 내 책상 서랍에도 없다. 대여섯 개는 되는 내 가방 안에도 없다. 아니면 강아지 꽁지가 물고 가서 어디 감춰 둔 것일까? 꼭지가 돌 일은 아니지만 선물 받은 만년필은 지금까지 분실된 상태다. 내가 잃어버린 상태다. 내가 그것을 그것의 존재를 잊어버린다 해도 변함없는 상태로 그것은 안 보인다. 그것은 분해된 것일까? 그것은 상부와 하부와 그리고 펜촉으로 분리된 상태일까? 아무려면 어떤가? 그것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상태로 그것은 있다. 어딘가에 있다. 없다면 없는 대로 생각나는 장소가 더 있을 것이다. 거기가 어딜까? 만년필이 안 보이는 장소는 많다. 어디 한 군데가 아니라는 것만 안다. 그곳이 어딜까?
김언은 본명이 아니다. 나는 작가로 데뷔하기 전에도 그를 알았는데, 늘 ‘언’이 형이라고 불렀다. 본명을 여러 번 들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고 관심도 없다. ‘언’이 형이라고 부르는 게 좋기 때문이다. 필명이 ‘언’인 시인. 나는 막연히 ‘언’이 ‘말씀’을 뜻하는 ‘言’이 아닐까 추정하는 것이다. 맞는지 틀린지, 역시 내가 알 바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듭 언이 형, 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름이 언인 시인 형.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언이 형이 3개월 동안 미국에 갔다. 오하이오였는지 아이오하였나, 그쪽에 있는 대학에서 문학 전공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고, 창작 활동도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역시 자세히 기억을 떠올리면 알겠지만 이 글에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략. 그때 나는 언이 형을 만나러 갔다.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휴가를 내고 비행기를 타고 굳이 갔다. 뉴욕도 LA도 아닌, 오하이오인가 아이오하를. 좋아하는 형이 있다고 하니 가고 싶었을까? 이유다운 이유가 못 되지만(그러게 왜 그랬나 몰라).
하루는 그쪽 문학 전공 학생들과 김언 시인의 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특강이 열렸다. 60분 정도였는데 학생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했고, 언이 형은 대답을 잘 못했다. 통역해 주는 분이 계셨지만, 아무래도 영어와 한국어가 오가는 대화니까 어떻게 말해도 충분하지 않았겠지. 그때 나는 손을 들고 알려 주고 싶었다. 저 시인 이름이 ‘언’이고, 아시아에서 ‘언’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러니 저 시인에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라고. 내가 판단하기에 대부분의 질문은 그저 저 이름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대답이 될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손을 들지 못했다. ‘샤이’했던 것이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시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김언의 시 ‘만년필’은 만년필에 대한 시가 아니다. 만년필은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또한 만년필에 대한 시이기도 하다. 사라진 것이 만년필이며, 어딘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는 것도 만년필이니까. 그리고 이름이 ‘언’인 시인에게 만년필은 특별한 물건일 테니까. 나는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만년필’을 내 맘대로 두 가지로 바꾸었다. 하나는 폭탄. 영화를 보면, 악당이 폭탄을 훔쳐 가고 착한 편이 그 폭탄을 찾는다. 악당은 폭탄으로 나쁜 짓을 할 게 분명하다. 그러니 착한 편은 폭탄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상상하고 추적해야 한다. 당연히 김언이 이런 걸 떠올리며 시를 쓰진 않았을 것이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음. 만년필은 내 것이었으나 나에게서 사라진 것이니까. 마음. 워낙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결국 시라는 게 ‘마음’의 흐름을 적는 것이고, 내가 늘 잊고 후회하는 것이기도 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로 갈까? 헤어지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은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를 떠난 것들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그것이 만년필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살면서 만년필을 선물 받은 적도 있는 것 같다. 어디 갔지? 이 정도 사용했으면 됐어, 하고 버린 기억이 없으니 잃어버린 거겠지? 발과 감정이 생겨서 가 버린 것 같네. 어딘가에서 또 무슨 ‘말씀’을 쓰고 있을까? 어릴 때 손에 쥐고 올려다보던 풍선이 어디로 갔는지도 궁금하다. 엄마가 사준 운동화도 지금 나에게 없다. 잃어버린 것, 잃어버리고 인식 못 하는 것이 많구나. 야, 너네 다 어디 갔니? 미안해, 이제야 기억나서. 아, 쓸쓸해지네.
그러나 이 시는 멀뚱히 앉아 쓸쓸하라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잃어버린 것이 만년필이다! 만년필은 정말 폭탄이거나 그보다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만년필이 쓰게 될 말들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나에겐, 마음이 만년필 같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게 된다. 후회하지 말아야 할 텐데, 내 경우는, 그렇게 떠나보낸 사람을 다시 그리워했다. 돌아오지 않았다. 잃고 싶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잃었다. 그러나 교훈을 전달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니 여기까지.
언이 형은 왜 만년필을 잃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을까? 그것 말고도 많을 텐데.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이 질문의 답 역시 이름 ‘언’에 담겨 있다. 이름에 걸맞게 모국어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김언 시인…. 뭐 이런 평가가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학상 심사위원들이 쓸 말이고. 가끔 전화를 걸어 맥락 없이 형의 이름을 부른다. 나도 시인인데 내 이름을 언이라고 짓지 않았고 만년필의 행방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서. 부러움과 애정과 존경을 담아. 그리고 오늘은 새삼, 사라진 것을 떠올린다. 기억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낸다. 그것은 어떤 세계에서 자라고 있을까.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