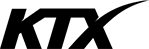나이가 들면, 이라는 생각을 종종 한다.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겠지. 노인의 기분은 어떤 것일까? 노인의 하루는, 노인의 희망은 어떤 것일까? 슬픔을 느낄 때 노인은 어떻게 막막함 속에서 빠져나올까? 아빠가 노인이 된 이후 이 질문들은 나에게 구체적인 것이 되어서, 가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다가 유년 시절을 떠올리며 그때의 용감하고 딴딴한 아빠의 모습이 그리워진다. 아빠는 8개월째 뇌졸중과 싸우고 있다.
늙기 전에 늙은 사람을 보는 일이 선행된다. 2020년 아빠는 일흔네 살이었고 당연히 지난해 일흔다섯 살이 되었다. 봄에 아빠는 갑자기 쓰러졌다. 눈을 떴지만 몸의 절반이 움직이지 않았다. 지금은 재활 중이다. 다행히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흔네 살의 아빠를 보며 노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일흔다섯 살의 아빠를 보며 노인이구나, 생각한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느리게 걸어가는 모습이 노인의 전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해가 드는 오후, 35년 된 아파트 놀이터에서 느리게 느리게 앞으로 나아가는 아빠를 보고 있을 때면 시간의 속도는 걸음의 속도와 반비례한다. 우리는 살아 있는 한, 걷기 위해 노력한다. 걷는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니까. “아빠에게 꼭 전해줘”라며 한 선배가 나에게 말해 주었다. “누워 있으면 죽고,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사는 거야.” 아빠는 내 손을 잡고 걸을 때 가끔 말한다. “봄이 되면 더 잘 걸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먼 훗날의 나를 떠올린다. 나에겐 있고, 아빠에겐 없는 봄을. 이제니가 쓴 ‘있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는 어떤 문장일까? 있지도 않으니 알 수 없는 것일까? 있지 않으니 누구나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이 글에서 시 읽기의 본질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 내가 상상하던 많은 문장이 있다.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그때는 제가 죄송했어요.” “아빠, 그때 지갑에서 만 원 꺼내 간 사람 저예요. 그리고 사실… 몇 번 더 그랬어요.”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것은 있지 않은 문장일 것이다. 또한 아빠의 걸음은 아직 쓰이지 않은 길 위에 생명의 문장을 또박또박 새기는 일일 것이다. ‘이보시오, 내가 아직 살아 있소’라는 문장일까? ‘이성길이가 아직 건재하오’라는 문장일까? 아빠는 움직이지 않는 왼팔을 찾으며 “우성아, 내 팔 어디 갔니?”라고 묻는다. 그러면 나는 아빠의 왼팔을 손으로 잡고 오른손 가까이 가져가며 “여기 있죠, 아빠”라고 말한다. 아빠의 삶, 아빠의 시간 안엔 무엇인가 부재해 있고, 그러나 그 부재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며 내 생명을 끝장낼 수도 없다고 아빠는 적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삶의 역설이 여기에도 존재한다. 나는 아빠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아빠의 손을 잡고 아빠의 등을 긁고 아빠 옷을 입히고 아빠랑 같이 화장실에 간다. 아빠 밥을 차려 드리고 아빠가 흘린 것들을 행주로 닦아 내고 약을 먹인다. “오늘은 복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 보고하듯 말하는 아빠에게 “와, 진짜 아빠?”라고 말하는 아들은 그저 이 모든 시간이 감사하고 복되다고 느낄 뿐이다. 나는 여기에 이 나날들을 문장으로 적고 있다. 아빠가 언젠가 내 옆을 떠나면 그때 아빠의 문장도 끝이 나고, 아빠는 있지 않은 문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니가 쓴 저 ‘있지도 않은 문장은 아름답고’를 깊이깊이 더 깊이 새길 수밖에 없다. 슬픔과 기대, 실망과 추억, 존재와 사랑 그리고 당연한 시간들이 모두 담겨 있어서. 있지도 않은 문장의 힘이라니!
이제니는 2008년 신춘문예로 데뷔했다. 내가 2009년에 데뷔했으니 1년 선배다. 이제니의 시를 좋아하는 독자가 많은 걸로 안다. 이제니의 시를 좋아하는 시인도 많다. 나랑 친한 시인은 모두 이제니의 시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문장은 시인을 구성하는 일부이며 전부일 텐데, 그러니 시인의 기쁨과 슬픔, 영광과 좌절도 모두 문장 안에 있을 것인데, 이제니는 아무도 쓰지 않은 문장을 쓰기 위해 시를 쓴다. 아무도 쓰지 않은 문장이라니. 그것이 있기나 한가. 그러니 ‘쓸 수 없는 문장’일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쓰고 있다. 있지 않은 문장을. 행위와 의지가 오롯이 ‘문장’이어서. 시인으로서 나는, 이제니의 문장에서 존경과 안도를 동시에 느낀다. 낯선 곳으로 나아가는 용기, 그러니 나도 한 번쯤 더 있지 않은 세계로 걸음을 옮겨 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안도. 아빠가 성한 오른발로 감각이 없는 왼발을 끌며 나아가는 걸 볼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무엇인가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의 생은 말하고 있다. “거리로 나서면 다시 돋는 잎사귀 곁으로 노인의 마음이 스쳐 지나간다”라는 문장이 나는 슬프지 않다. 용감한 아빠, 저 누추한 노인이 분명하게 걸어서 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함께 맞게 될, 그러므로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봄이라는 문장을 향해.
추신. 이제니 시인이 제67회 현대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머지않아 저는 그 문학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시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