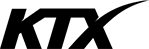봄에 뿌린 것은 가을에 거둔다. 품 넓은 지리산 자락에 안긴 경남 하동 악양, 하고도 입석마을에 가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선한 이들을 만난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고사리와 찻잎, 매실과 감이 나는 비옥한 땅에 언제인가부터 낯설고도 아름다운 조형물이 하나둘 놓이기 시작했다. 마을 입구엔 손님을 반기는 나팔수 입상이, 길목엔 날개를 팔랑이는 부엉이 삼 형제 조각이, 마을회관 맞은편엔 ‘선돌’이란 옛 지명을 가져다 붙인 아담한 미술관이 올라섰다. 말간 도화지 같던 마을에 알록달록한 빛깔이 스며드니 주민들의 표정도 한결 화사해졌다. 예술의 힘이다.
마을미술프로젝트, 입석마을이 맞이한 변화의 바람
입석마을이 위치한 하동군 악양면은 드라마 <토지>의 최참판댁 촬영장과 그림 같은 평사리 소나무로 이름난 고장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명소이니만큼 해마다 20만 명 가까운 여행자가 이곳을 찾았지만, 악양면의 작은 부락 구석구석까지 발길이 닿진 못했다.
변화의 계기는 홀연히 다가왔다. 2018년 악양 일대가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되었고, 미술가이자 예술 단체 ‘예술행동’을 이끄는 하의수 대표를 주축으로 재능 있는 작가들이 집결한 것이다. 이들은 최참판댁 촬영장 입구부터 하평마을, 대촌마을, 봉대마을, 하덕마을을 지나는 길에 작품을 설치해 자연과 미술이 어우러지는 근사한 장면을 연출했다. 애석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작가들은 자연히 악양을 떠났고, 작품만 덩그러니 남아 마을 곳곳을 지켰다.
2020년, 지속 가능한 예술 공동체를 고민하던 예술행동은 입석마을을 중심으로 마을미술프로젝트에 또 한 번 도전한다. 대봉감을 수확하고 곶감 만드는 일로 생활을 이어가던 평화로운 입석마을은 신석기 유물인 선돌과 유구한 역사를 품은 곳으로, 예술의 싹을 틔우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예술행동과 하 대표는 우선 창고를 개조한 작업실 겸 마을미술프로젝트 사무국 ‘대촌상회’를 베이스캠프 삼아 마을 사람들과 깊은 교분을 나누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고는 마음을 내준 사람들에게 조형적 미감이 무엇인지, 나아가 예술이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파했다.
입석마을의 마을미술프로젝트는 2020년 첫 시도엔 낙방했으나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당선되어 11점의 작품을 설치하는 성과를 이뤘다. 예술이 지닌 환한 기운에 매료된 마을 사람들은 도슨트를 자처했고, 작품과 일대일 관계를 맺으며 애정을 키웠다. 예술은 작품과 미술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가면을 쓰고 등불을 든 채 신명 나는 사물놀이 한마당을 벌여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물들기도 했다. 예술을 파종한 마을은 문화 콘텐츠라는 싹을 틔워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갔다.
한 걸음, 마을을 수호하는 예술
이제 입석마을을 둘러볼 시간. 지명 유래를 새겨 넣은 비석 위에 나팔을 치켜 든 사람의 형상이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로 우뚝 섰다. 심준섭 작가의 ‘입석, 평사리를 깨우다’는 고요한 들녘에 울려 퍼지는 시원스러운 관악기 소리를 떠오르게 한다. 골목에 접어들자 부엉이 세 마리의 날개가 펄럭이는 모습을 맞닥뜨린다. 정찬호 작가가 제작한 ‘쎄오’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중 반복되는 음절인 “세요”에서 착안한 제목처럼 마을을 오가는 이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얼마나 걸었을까, 제단처럼 쌓은 돌무더기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선다. 김상일 작가는 헐어 버린 돌담을 재활용해 탑을 만들곤 ‘심수상응, 새로운 기억 만들기’란 이름을 붙였다. 주민의 마음과 작가의 손이 감응해 또 하나의 추억을 덧댔다. 마을 사람들이 앉아 쉬는 정자에도 예술은 스며 있다. 정만영 작가의 다매체 작업 ‘선돌과 매달린 돌’은 천장에 센서를 설치하고 스피커를 내장한 돌을 매달아 입석마을에서 채록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정자에 걸터앉아 당산나무를 바라보니, 나무 그늘 아래 시멘트로 빚은 오리 떼가 종종거리며 밭을 거닌다. 김경화 작가의 ‘마을을 지키는 새’가 겨울 햇살처럼 포근한 정경을 이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일상과 미술의 공존을 꿈꾸는 공공 미술 사업이다. 악양면에서는 2018년 처음으로 공모 사업에 당선되었고, 입석마을은 하동군의 지원하에 2022년과 2023년 두 해에 걸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단단한 마을 예술 공동체를 꾸렸다.
두 걸음, 예술이 된 마을 광장
좁은 골목길을 뒷짐 지고 오르다 보면 탁 트인 빈터에 다다른다. 사방에서 길이 모여든 이곳은 선돌광장이다. 지리산 걷기꾼의 사랑방 ‘형제봉 주막’과 ‘마을미술관 선돌’, 마을회관이 광장을 둥글게 둘러싼다. 광장 한편으로 이어진 돌담 너머엔 독특한 형상을 한 바위가 떡하니 자리한다. 이름하여 잔대바위. 마을을 사이에 둔 두 산, 형제봉과 구재봉의 신선들이 장기판 앞에서 실랑이를 하다가 잔대 위 잔을 들어 던졌는데 이때 내던진 잔은 신선대 바위, 잔이 놓였던 잔대는 잔대바위라 부른다는 설화가 전해 온다. 문병탁 작가는 바위 주변에 아카시아 목재로 사슴을 제작해 ‘잔대바위 지킴이’란 역할을 부여했다.
선돌광장의 구심점인 마을미술관 선돌은 이곳 사람들의 삶을 녹여 낸 질박한 작품을 소개한다. 거창한 철학이나 사조를 외치기보다는 일상과 자연을 진솔하게 노래한 작품이 환영받는다. 전시실 한편엔 소쿠리, 베틀, 놋그릇, 맷돌, 화로, 저울, 상여 종 등 주민이 직접 쓰던 물건을 수집해 펼쳐 놓았다. 말 그대로 삶이 예술로 환원하는 풍경이다. 공동 작업장이자 창고로 쓰던 옛 건물을 업사이클링한 미술관 외벽엔 반사율이 좋은 알루미늄 패널 조각이 원을 이루며 걸렸다. 이정형 작가의 작품 ‘비치다’다. 섬진강이 거느린 넉넉한 산천 풍경을 빨아들인 이 작품은 일종의 대지 미술이자 미디어 파사드인 셈이다.
세 걸음, 골목과 담벼락에 스민 예술
지리산둘레길 14길이 지나는 입석마을엔 더러 산꾼이나 뜨내기 여행자가 발을 들인다. 낯선 객에게 숨 돌리고 쉬었다 가라며 말을 거는 작품이 하나 있다. 파란색 담벼락 위에 색색으로 사람 형상 조형물을 얹어 놓은 ‘일상, 잠시 내려놓다’다. 먼 옛날 씨감자와 누에, 뽕잎을 이고 진 주민들이 오가던 이 길에 유재현 작가만의 감각적인 색깔과 위트, 여유가 깃들었다. 한편 배철호 작가는 스테인리스스틸 소재로 배꽃이 활짝 핀 나무를 조각해 ‘자연의 품속으로’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 마을에선 눈 닿는 곳 어디든 다 자연이다.
언덕 윗녘에선 입석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작품인 정만영 작가의 ‘구술 전화기’를 만난다. 마을 초입 정자에 설치한 ‘선돌과 매달린 돌’처럼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채록했고, 나아가 자연의 소리까지 담아 낸 공중전화 부스다. 지정된 전화번호를 누르면 천장 스피커에서는 당산나무 새소리와 새벽 섬진강 물소리가, 수화기에서는 삼 삼고 베 짜던 시절이나 당산제와 나룻배 이야기가 육성으로 흐른다. 오래도록 가슴 한편에 재생하고 싶은 소리다.
입석마을로 놀러 오세요

박인봉 입석마을 이장
“지리산 자락의 멋진 풍광은 우리 입석마을의 큰 자랑입니다. 귀촌 인구와 원주민이 허물없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에도 자부심을 느끼지요. 5년 동안 마을미술프로젝트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면서 자연스레 미술에 관심이 생겼는데, 작품 중 유독 마음에 드는 것은 미술관 외벽에 걸린 ‘비치다’랍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과 자연을 두루 비춰 아름답지요.”

이성심 입석마을 도슨트
“고향 하동읍을 떠나 수도권에서 40년 남짓 살았지만, 악양 땅이 좋아 귀촌한 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입석마을에 집을 짓고 보니 예술행동과 마을미술프로젝트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고, 차츰 이 활동에 녹아들었지요. 작품 ‘심수상응, 새로운 기억 만들기’를 일대일로 담당하며 남다른 애착이 생기더군요. 지금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이 작품을 설명해 드린답니다.”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