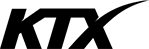책을 펼쳐 첫 장을 읽는다. 영월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청령포에 바람이 분다.” 불어오는 대로 송림 나뭇가지들이 흔들린다. 살짝, 그러나 서걱 소리는 오래 울려 번진다. 송림은 높고 울창하다. 솔잎 무더기에 가린 하늘이 성긴 햇발을 뿌린다. 짙으며 빽빽한 소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몇 가닥 빛이 땅에 튕겨 솟는다. 가는 빛이 모여 낸 길을 따라 바람이 솔바람 되어 청령포를 빠져나간다. 어떤 때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고요하게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조선 6대 왕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청령포로 유배됐다. 삼면이 서강에 둘러싸이고 나머지는 산에 막힌 육지 속 섬이다. 지금도 배를 타야 들어간다. 문의 033-372-1240

조선 6대 왕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청령포로 유배됐다. 삼면이 서강에 둘러싸이고 나머지는 산에 막힌 육지 속 섬이다. 지금도 배를 타야 들어간다. 문의 033-372-1240
하늘이 푸르러 서러운 유배지, 청령포
영월은 글을 읽어 주는 것 같다. 한편에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맞은편에서 차령산맥이 장벽을 쳤기에 여기는 곡곡이 험준하다. 산간에 터를 틀어 산 까닭이 아니 간절했을까. 능선과 골짜기를 오르내리는 삶에 곡절 하나쯤 없었겠고. 산마다 그것을 붙잡아 올라야 한 사연, 강마다 그것에 기대 흘러야 했던 이유가 박혀 오늘도 영월은 들려준다. 산천이 기억하는 이야기를 짚어 저를 찾아온 객 앞에 펼친다. 첫 장은 이곳, 어린 왕의 유배지 청령포다.
단종은 조선의 여섯 번째 왕이다. 아버지 문종이 즉위 2년 만인 1452년에 요절하자 그해 임금이 됐다. 무르익은 계절은 꽃을 피우고 함박눈을 내려 세상을 덮는다. 임금은 열두 살이었다. 이른 계절, 꽃봉오리는 연약하며 풋눈은 가늘어 사라지기 쉽다. 시간이 필요했다. 봄이든 겨울이든 세월이 지나 어김없이 온다. 결국 꽃이 피어날 것이었다. 대지는 하얗게 물들 것이었다. 하나, 임금은 열두 살이었다. 나라를 지고 가기에 연약하고 가늘어 사라지기 쉬웠다. 즉위 이듬해 숙부가 계유정난을 일으켰다. 수양대군은 좌의정 김종서를 습격해 제거하고 연이어 신하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아들을 지켜 달라는 선왕의 당부를 받들던 중신들이 역모의 누명을 뒤집어쓴 채 망자가 되었다. 이제 임금을 지킬 사람은 없다. 서러운 마음을 앞장서 다독여 줄 사람도 없다. 1455년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양위했다. 꽃봉오리는 꺾였다.
단종이 애통한 마음 달래며 서성인 유배지 청령포.
오늘, 봄 햇살이 따듯하건만 단종의 그 마음 기억하는 소나무들이 굽어 땅을 내려다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임금이 탄식했다는 기록이 남았다. 길게 내쉰 숨에 작더라도 희망이 숨었을지 모른다. 어제로 되돌리자는 게 아니라 단지 내일을 살겠다는 희망. 하지만 왕은 한 명이어야 했다. 권력의 꼭대기로 치닫는 숙부에게 조카는 넘어야 할 마지막 고개였다. 1457년, 청령포로 유배를 왔다. 서강이 삼면을 에워싸고 나머지 서쪽을 산이 막은 육지 속 섬, 청령포는 여전히 배를 타야 들어가는 벽지다. 단종 또한 보았을까. 가는 빛이 모여 낸 길을 따라 오직 솔바람만 계속 청령포를 빠져나가고 있다.
송림 한편, 그가 머문 집을 복원한 단종어소에 들었다. 봄의 온기가 사위를 적신다. 마당에서 자라는 나무는 몇 그루뿐이어서 하늘이 마음껏 넓고 푸르다. 막다른 곳이 왜 이리 아름다운가. 아이는 열일곱 청년이 됐는데 깊숙한 여기에 갇혔다. 한창 뻗을 시기를 숨죽이고 굽어 살았다. 홍수를 피해 영월의 객사 관풍헌으로 유배지를 옮기기 전까지 두 달간 청령포는 웅그린 청년의 온 세상이었다. 그 세상은 꽃이 피지 못하고 함박눈은 닿지 않는다. 우리는 하늘을 당겨 마당에 내려놓았다. 꺾였어도 보이기를, 향기롭고 순백한 지금을.
송림이 울창한 청령포를 걷고 걸어서 절벽에 오르면 저 아래 서강은 별처럼 반짝여 준다.
단종이 가슴에 담던 풍경들이다.
단종이 바라본 소나무와 서강의 풍경
어소에는 단종의 모습을 재현해 두었다. 소나무 하나 외로이 선 마당 옆, 어두운 방에 앉아서 무언가 읽는다. 다 썼으니 한 번 더 다듬어 들려주겠다는 듯 몸을 낮춰 글을 살핀다. 이야기는 아주 길 것이되 끝이 촉박하다. 관풍헌으로 유배지를 옮기고 두 달 뒤 단종은 죽음을 당한다. 사약을 마셨다거나 목을 졸렸다거나 설이 많지만 모두 제 뜻은 아니었다. 송림에서 마주한 어떤 때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어소에서 나와, 그가 걸터앉아 쉰 관음송을 올려다봤다. 시름에 잠겨 서성였다는 노산대 인근 절벽에서는 서강을 내려다봤다. 울울창창한 솔숲이 위에서부터 맑다. 아래에서 서강의 빛이 샘솟는다. 열일곱 청년이 한 움큼씩 집어 가슴에 묻은 풍경들이다. 너무 고와 아리다. 속절없이 돌아서는 객을 솔숲과 서강이 붙잡아 들려준다. “하늘은 귀가 먹었는지 애달픈 하소연 어이 듣지 못하시는고/ 어찌해서 슬픔 많은 이 몸의 귀만 홀로 밝은 것인가”(단종 ‘자규시’ 중). 청령포에 봄이 왔다. 이제는 들리시는가. 이름은 홍위(弘暐), 조선의 여섯 번째 왕이다.


<KTX매거진>×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영월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 4월 1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세월의 바로 지금, 고씨굴
저 남한강은 동강과 서강이 합한 것이다. 얼마 뒤에 북한강을 만나고 한강이 되어 서해로 간다. 서로 다른 곳에서 나왔다가 마주 보고 하나로 흐르는 강의 여정은 대양에서 원점으로 회귀한다. 증발하여 구름으로, 구름에서 비로, 비가 내리고 모여 각자 발원지로. 무궁한 순환의 한 점인 이곳 남한강은 태화산 자락을 어루만져 나아간다. 풍경은 선명하건만 오고 가는 영원의 시간은 아득해 다가가려 해도 희미하다. 우리는 멈춰서 시간을 지우고 봤다. 대양에 뿌린 씨앗, 발원지에서 움튼 싹이 남한강 줄기에 떠올라 태화산을 비춘다. 시간이 벌린 아득한 거리를 거두어 내니 이 순간은 강과 산의 영원이다. 고씨굴로 향하는 길에서 영월이 둘째 장을 펼쳤다. 유구하고 찰나 같은 시간의 이야기다.
4억 4400만 년 전, 혹은 4억 8800만 년 전에 바다 아래에서 석회암이 쌓여 지층을 이루었다. 당시 적도 부근에 생성된 지층은 이후 천천히 북진했다. 변형, 이동, 재차 변형과 이동의 오랜 세월을 통과해 현재 한반도 위치에 다다랐을 때 지층이 융기했다.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은 지하수에 담긴 이산화탄소에 녹으며 깎인다. 용식작용이라 부르는 이 화학반응이 지표면에 노출된 지층을 안에서 허물었다. 인간이 일생을 관찰한대도 알아채기 힘들 만큼 조금씩, 그러나 오늘날까지 수천만 년간 지하수는 석회암을 파냈다. 태화산 지하수가 남한강으로 빠지는 통로인 고씨굴은 마침내 길이가 주굴 950미터, 지굴 2438미터, 총 3388미터가 되었다. 몇 미터쯤 더 길 수도 있다. 자연은 무궁하게 순환한다. 다리를 밟아 남한강을 건너서 고씨굴에 들어갔다. 빛이 단절되고 순식간에 암흑이다. 굴에 은둔한 수천만 년 시간이 까맣게 밀려든다. 바로 이 순간이다. 발원지와 대양 사이의 한 점, 그리고 영원.

고씨굴 입구를 지나자 빛이 단절되고 순식간에 어둠이다.
굴에 은둔해 온 수천만 년 시간이 까맣게 밀려든다.
입구에서부터 굴은 폭을 좁힌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가기 어려운 구간도 여럿이다. 조명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부닥치고 넘어진다. 무엇보다 어둠은 좁은 길에서 더 어두워진다. 빨아들이는 듯 깊은 암흑을 조명에 의지해 더듬어야 한다. 조심히 몸을 다뤄 걸음을 딛는다. 길에 순응하느라 유순해지는 몸짓과 반대로 굴은 점점 장엄하다. 시선이 꽂히는 곳마다 천장의 종유석, 바닥에서 돋아난 석순이 따로 함께 들고 난다. 어디는 회황색 암석이 물기에 젖어 반들반들하고, 다른 어디는 마른 돌덩이들이 모래 알갱이인 양 느슨하게 흘러내렸다. 돌의 변주는 지굴들이 합쳐진 은하수광장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갑작스레 터진 광대한 공간에서 갖은 모양새가 아우러져 축전을 벌인다. 동일한 화학반응에서 드러나는 형태는 전부 상이하다. 모두 같지 아니한데, 모든 것은 조화롭다. 서로 다른 곳에서 나왔다가 마주 보고 하나로 흐르는 강의 여정처럼.
고씨굴이 빚는 풍경의 변주가 지굴들이 합쳐지는 공간에서 절정을 이룬다.
하나도 서로 같지 않은데, 모든 것이 조화롭다.
순환하는 영월의 시간
문득 들리는 소리를 쫓아 돌바닥 틈을 들여다봤다. 물이다. 융기한 석회암 지층을 허물어 굴을 낸 물이 계속 움직인다. 이 물도 발원지에서 나왔겠고 남한강에 합류해 결국에는 대양으로 간다. 어느 날 증발해 구름과 비로, 다시 발원해 돌바닥 아래 바로 이 순간이다. 영월에는 시간이 흐른다. 그것은 영원하게 유구하고 언제나 찰나 같다.
돌아오리라 기약하고 어두운 탄광에 몸을 넣어 막장을 헤집으며 탄을 캐고는 광부는 정말 돌아왔다.
광산촌의 하루는 그렇게 저문다.
막장을 앞에 둔 삶, 강원도탄광문화촌
광부는 막장이 시작이다. 탄을 캐서 광차에 실어 보내고 뒤돌아 캔다. 채탄할수록 탄맥은 물러난다. 광차에 실어 보낸 광부는 새로운 막장으로 전진한다. 그들은 줄곧 위태로웠다. 석탄가루가 폐에 들러붙고 산은 육중해 갱도를 압박한다. 검어서 보이지 않는 앞은 도무지 환해지지 못하는 것이어서 검은 채로 두어야 한다. 따끈한 밥 한 그릇 벌어 곁과 나누는 삶은 거기가 시작이었다. 우리는 영월 마차리 강원도탄광문화촌을 걸어 옛일을 헤아리고 있다. 하루가 간절하던 이들의 흔적이 갱도와 탄광촌을 재현한 전시실에 생생하다. 감히 세상은 막장을 흔하게 말해 왔다. 허투루 형용하고 되는대로 빗댔다. 앞을 검은 채로 두어야 하는 삶의 깊이는 밖에서는 알 수 없다. 광부는 막장에 파고들어 온몸으로 생을 캐냈다.
1935년 마차리 기슭에서 영월광업소가 문을 열었다. 일제가 영월화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개발한 광업소는 외진 산골을 영월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대여섯 가구만 살던 마차리로 외국에서까지 사람이 몰려들었다. 영월화력발전소 사용량이 감소한 1972년 잠시 폐광했으나 재개발 이후 1970년대 후반엔 최대 6만 명이 마차리에 거주했다 추정한다. 영월 인구의 절반이었다. 온통 산인 오지의 가파른 비탈에 집이 들어찼다. 상점과 음식점이 북적였고 영화관은 서울에서나 볼 법한 신작을 상영했다. 석탄은 당시 말마따나 검은 황금이 되어 주었다. 겉은 이리 화려해도 속은 달랐다. 사람들은 판잣집을 스무 개로 쪼개 하나씩 사용했다. 시설은 방 한 칸과 부엌이 다였다.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마땅찮은 환경 탓에 집 주변은 늘 구저분했다. 광부들은 쪽방에서 자고 일어나 버려진 것들을 지나서 막장으로 향했다.
생활관 전시실에서 1960년대 마차리의 일상을 엿본다. 강원도탄광문화촌은 집과 골목을 과거 모습 가깝게 짓고 곳곳에는 탁주를 마시는 사람, 생필품을 배급받는 사람, 공동 수도에서 물을 긷는 사람 인형을 놓았다. 탁주 심부름을 하는 아이가 천진하게 웃는다. 담벼락에 걸린 그림 속 광부의 미소가 참으로 깨끗하다. 감상하기 적당하게 꾸민 얼굴이겠거니, 하다가 멈칫 서서 사람을 생각했다. 다닥다닥한 판잣집에 몸을 누이며, 나갈 때는 돌아오겠다 기약해야 하는 고된 일상이었다. 다시 아이와 광부의 얼굴을 본다. 산다는 건, 무엇이 어떠할지언정 살아야 한다는 것일는지. 근심스럽고 애달프기에 살아 있는 지금이 더욱 귀하다. 마차리의 역사는 겉이 화려해도 속은 고단했다. 마차리의 삶은 겉으로 고단했으나 속으로는 아마 그대로 삶이었다. 슬픔과 기쁨을 녹여 담은 탄광촌의 얼굴이 천진하고 깨끗하다.
생활관 옆은 야외 채탄 시설 전시장이다. 광차에 싣고 탄광을 나온 석탄을 쏟아 내는 티플러, 와이어로프로 광부를 나르는 권양기 등 각종 장치가 즐비하다. 장치 너머엔 폐석이 쌓였다. 유용한 석탄과 쓸모없는 폐석을 가리는 선탄 작업은 대부분 여성이 해 왔다. 탄광에서 몸이 망가진 광부, 숨을 거둔 광부의 가족은 당장 생계가 급해서 광업소는 그들이 선탄 작업을 전담하도록 했다. 선탄부라 불린 그들은 아내, 엄마였고 그보다 먼저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나 불의의 현실은 아프다. 먹고사는 일은 모두에게 무겁다. 그래도 선탄부들은 쪽방에서 일어나 버려진 것들을 지나서 선탄장으로 향했다. 선탄장은 그들의 막장, 온몸으로 생을 캐낸 곳이다.
광부가 탄광에 들어가고 탄광에서는 석탄이 나온다.
사람을 덥혀 주는 석탄엔 위험을 감수하는 고된 노동의 피와 땀이 맺혔다.


갱도 체험관에서는 광부가 굴을 파서 채탄하고 석탄을 옮기는 과정을 갱도 모형과 광부 인형을 통해 차례차례 만난다. 영월광업소가 활발하던 당시 광부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감상할 수 있다.

갱도 체험관에서는 광부가 굴을 파서 채탄하고 석탄을 옮기는 과정을 갱도 모형과 광부 인형을 통해 차례차례 만난다. 영월광업소가 활발하던 당시 광부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감상할 수 있다.
걷고 걸어서, 끝을 넘어서
강원도탄광문화촌 한편에 실제 갱도였던 공간을 활용한 체험관이 자리한다. 생활관과 마찬가지로 갱도 모형을 짓고 광부 인형을 설치했다. 그 덕분에 광부가 들어가서 석탄이 나오는 과정을 차례차례 만난다. 굴진은 탄맥에 닿기 위해 갱도를 뚫는 작업을 총칭한다. 경로를 가로막는 암석은 폭약을 터뜨려 무너뜨리는데, 이를 발파라 한다. 쇠나 나무 기둥을 받쳐 갱도를 지탱하는 동발 설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가 어긋나면 지압이 뭉쳐 갱도를 짓누르는 힘이 점차 커진다. 이렇게 굴진한 다음 광부는 채탄한다. 탄을 캐서 광차에 실어 보낸 뒤 새로운 막장으로 전진한다. 동발로 생명을 받치고 굴을 파내 삶의 경계를 넓혀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 막장은 끝일 수 없다. 석탄가루가 날아드는 육중한 산의 후미진 안쪽, 앞을 검은 채로 두어야 하지만 저 암흑에 길이 있다. 무엇이 어떠할지언정, 닫힌 것들을 열어서 사람은 나아간다.
체험관 끝에서 벽화를 봤다. 일을 마친 광부가 어둠을 거슬러 탄광 입구로 돌아왔다. 숲이 울창하고 하늘이 파랗다. 능선에 걸친 태양이 환하다. 햇살로 향하는 광부의 뒷모습이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다. 감사하오, 영월.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며 파란 하늘과 햇살 속으로 들어갔다.
Yeongwol Speaks to You
Yeongwol, a county in Gangwon-do Province, tells stories of the lives it has witnessed, both happy and sad.
The story of Yeongwol begins, “A wind blows at Cheongnyeongpo Cape.” The branches of the pine trees sway in the wind, and the sound of rustling leaves lingers for a long time. Sometimes, it is silent all around. I wait quietly for the next story.
Cheongnyeongpo Cape, a Melancholy Place of Exile
Yeongwol seems to read to us. The area is rugged and rough, with the Taebaek Mountain Range and Sobaek Mountain Range on one side and Charyeong Mountain Range on the other. Life here has been one filled with struggles, as can be expected from the high ridges and deep valleys. The stories that the mountains and streams remember are told to visitors who come seeking them.
The first chapter is about Cheongnyeongpo Cape, where the young king was exiled. Danjong was the sixth king of the Joseon Dynasty. He became king at the age of twelve but was exiled by his uncle, Grand Prince Suyang, to Cheongnyeongpo Cape in 1457. He lived there for two months. The beautiful Cheongnyeongpo Cape, covered with pine trees, exudes a melancholy atmosphere, as though reflecting the young king’s plight. He was only 17 when he was executed, and Cheongnyeongpo Cape offers a glimpse of his tragic life.
After visiting Cheongnyeongpo Cape, I headed to Gossigul Cave. This cave was created over thousands of years by groundwater eroding the limestone layer. Located at the foot of Taehwasan Mountain, the cave is 950 meters long in the main tunnel, and 2,438 meters long in the secondary tunnel, making it a total of 3,388 meters. Various cave formations such as stalactites and stalagmites can be observed in the dark cave, creating a spectacular sight. They are all different, yet everything is harmonious. Following the sound, I peered into the cracks in the stone floor. It was water. The water that created the cave by eroding the limestone layer continues to flow to this day.
Rediscovering the Plight of Miners
The Gangwon-do Coal Mine Culture Town in Macha-ri is an exhibition hall that reproduces the coal mine and village of Yeongwol Mining Company. The living quarters, one of the facilities, takes you back in time to the daily life of a miner in the 1960s. The restored alleyways features dolls of people drinking rice wine and receiving their daily supplies. A child running an errand to fetch rice wine is grinning brightly. The painting on the wall shows a miner with a sincere smile. They lived in cramped shacks, and left the house with a promise to their loved ones that they would return. Looking back at the faces of the child and the miner, I realize that they could smile as they did because they lived in more worrying, distressful times.
Next to the living quarters is an outdoor exhibition hall for various equipment, including a tippler that pours out coal loaded on a mining wagon. A pile of waste rock can be seen beyond the equipment. Women were usually assigned to the task of separating useful coal from waste rock. They were family members of miners who had passed away in mines, but they had to make a living despite such painful memories. They had to put up with the unfair reality and earn every penny they could to survive. Their workplace was a battlefield, a place of physical and emotional suffering. The story of Yeongwol ends here today. Thank you, Yeongwol. I bid farewell to Yeongwol for now.
영월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
즐길 거리 단종문화제
조선의 여섯 번째 왕 단종을 기리는 단종문화제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장릉, 영월문화예술회관, 동강 둔치에서 열린다. 팬데믹이 끝나 가는 올해는 행사를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일 없이 내용과 규모 면에서 영월을 대표하는 행사다운 모습 그대로 기획했다. ‘다시 찾아온 영월의 봄’을 주제 삼아 강원도 무형문화재 단종제향, 진혼 의식인 영산대재부터 단종 유배길 체험까지 각종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한 것이다. 4월 29일 영월군 시내 일원에서 단종문화제의 상징인 단종국장 야간 행렬을 펼쳐 외롭게 떠난 넋을 위로한다.
문의 033-375-6353 -
즐길 거리 젊은달와이파크
영월은 ‘박물관 도시’로 불린다. 스무 곳 넘는 박물관 중에서도 젊은달와이파크는 영월 여행객이 놓치기 힘든 여행지다. 한동안 운영되지 않은 술샘박물관을 조각가 최옥영이 재생과 순환의 의미를 덧붙여 재구성한 결과 활기 넘치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났다. 2만 6000제곱미터(약 7800평) 규모 젊은달와이파크는 전체가 시각의 축제장이다. 하얀 미술관과 강렬하게 대비하는 작품 ‘붉은 대나무’를 통과해 소나무 장작을 엮은 ‘목성木星’, 미술관 위에 조성한 ‘붉은 파빌리온’ 등이 색채의 향연을 벌인다.
문의 033-372-9411
-
먹거리 마차집
강원도탄광문화촌은 일을 마친 광부들이 들러 탁주를 마시던 대폿집을 생활관에 재현해 두었다. 가게 이름은 마차집. 피로를 푸는 쉼터였던 마차집이 강원도탄광문화촌에 또 있다. 애호박돼지고기찌개와 감자옹심이칼국수를 만들어 파는 진짜 식당이다. 문화촌 입구 앞 식당에 들어서자 수십 년 전 대폿집 풍경을 그린 벽화가 반긴다.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한 식당에 앉아 애호박을 송송 썰어 넣은 돼지고기찌개, 들깨 국물로 끓여 낸 감자옹심이칼국수를 먹어 본다. 그 시절에도 이랬을까. 탁주를 마시며 오래 즐기고 싶은 맛이다.
문의 0507-1311-5908 -
먹거리 고씨굴
칡국수촌 고씨굴을 들른 이는 굴 건너편 식당 거리가 칡국수 가게로 가득한 장관을 마주한다. 외부에 칡국수 세 글자를 내걸지 않았더라도 일단 주문하면 뚝딱 만들어 내놓는 데도 많다. 50여 년 전에 한 식당이 영월에서 채취한 칡으로 국수를 요리했고, 이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사람이 밀려들었다. 칡국수 식당이 마을을 이루다시피 빼곡한 지금 또한 ‘고향식당‘을 비롯한 가게들은 영월 칡을 재료로 써 국수를 빚는다. 고향식당에서 칡국수 한 그릇을 주문했다. 칡 향이 야무지게 밴 면과 국물이 입맛을 살살 돋운다.
문의 033-372-9117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