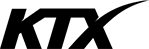"수행하는 이들이 사경을 하듯, 저도 작품 하는 사람으로서 저만의 사경을 시작했습니다."
대미필담(大味必淡). 정말 좋은 맛은 필시 담백하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강미선이 눌러 쓴 네 글자 앞에서 문득 ‘맛’이란 단어를 ‘멋’으로 바꾸고 싶어진다. 그의 글씨와 그림엔 언제나 담담한 멋이 흘러 넘친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미감의 완벽한 균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 그는 온갖 수고로운 일을 묵묵히 감내한다. 여러 겹의 한지를 쌓아 올린 뒤, 표면을 붓으로 두드려 질감을 도탑게 만들고, 그 위에 담묵으로 재차 덧발라 수묵만이 도달할 수 있는 오묘한 먹빛을 완성한다. 시간과 공기와 영감이 빚어낸 그의 오톨도톨한 화폭을 바라보는 동안, 진정한 멋이란 그리 소란하거나 요란하지만은 않음을, 또한 결코 쉬이 얻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요즘엔 소리 없이 사는 일에 대해 생각하곤 해요. 두보의 시 ‘춘야희우(春夜喜雨,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에 나오는 ‘윤물세무성(潤物細無聲, 소리도 없이 만물을 적시네)’이라는 구절이 좋아서 그걸 써 보기도 했어요.” 봄비처럼 바지런했을 그의 손길을 잠시 상상해 본다.
강미선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된다. 빛이 완연히 스미기 전, 모든 사물이 적요에 잠긴 시간. 가만히 앉아 명상을 하고, <금강경>을 읽는다. 6년 전 그는 광주의 한 사찰에서 <금강경>을 처음 건네받았다. 잘 아는 스님이 이 불경을 읽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생각도 샘솟을 거라 했단다. 반신반의하며 펴 들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의 단초가 될 줄은,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

“그거 아세요? 감물은 연둣빛 땡감으로만 들일 수 있다는 거. 감이 주황색으로 익기 시작하면 염색할 수가 없답니다.”
<금강경>, 모든 것의 연결 고리
중견 수묵화가로서 강미선은 수묵이라는 양식이 지닌 저력을 펼쳐 보이고자 조용히 사투를 벌여 왔다. 한지 마티에르(재질감) 작업을 통해 ‘여자 박수근’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독보적 작품 세계를 구축하며 인정받았으나, 화려한 색깔과 형상을 선호하는 예술계의 흐름 속에서 수묵이 할 일은 무엇인지 한동안 치열하게 고민해야 했다. 지난봄에야 불현듯 다가온 것이 <금강경>이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금강경>은 읽거나 지니는 것만으로 복이 깃든다.’ 제게도 그렇게 <금강경>이 작업의 실마리를 던져 주었어요. 사찰에서 수행하는 이들이 사경을 하듯, 저도 작품 하는 사람으로서 저만의 사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10년에 걸쳐 수집한 한지를 꺼냈다. 강원도 원주와 지리산 마천골 등지를 돌아다니며 그러모은 귀한 것들이었다. 빛깔과 무늬가 저마다 다른 여러 장의 한지를 겹겹이 배접해서 말리고, 그것을 다시 손바닥만 한 크기로 잘랐다. 이때, 칼로 자르지 않고 손끝으로 뚝뚝 떼어 질감을 살렸다. 지문이 다 닳을 만큼 고된 일이었다. 이렇게 잘라 낸 종이 위에 <금강경>을 한 자씩 써 넣었다. 수행에 가까운 작업을 이어가길 100여 일, 끝내 총 5149자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금강경金剛經-지혜의 숲’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금강경>의 근간인 공(空) 사상은 ‘마음을 한데 머물게 하지 마라’ ‘모든 형상이 허망하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적어 내려간 글의 마지막 두 줄은 제 발원 기도문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저 인연 맺는 모든 이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한 자 한 자 눌러 썼지요.”
작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미선은 ‘금강경金剛經-지혜의 숲’ 작업에서 배접한 종이를 떼어 낸 판 위에 조각보처럼 근사한 격자무늬가 만들어진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그러다 문득 작업실 마당에 떨어진 땡감을 발견하곤, 그것을 거의 으깨듯 판에 문지른 뒤 색깔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 여름이었다. 햇살은 눈부셨고, 감물 먹은 한지는 나무 빛깔처럼 곱고 은은하게 말라 갔다. 천연 염색에 조예가 깊은 작가의 즉흥적인 아이디어가 또 다른 대작 ‘무언가無言歌’를 착상하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그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귀띔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감물은 연둣빛 땡감으로만 들일 수 있다는 거. 감이 주황색으로 익기 시작하면 염색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6월 말부터 부지런히 땡감을 모으고, 자르고, 믹서를 세 대나 고장 내면서 즙을 짰다. 처음에 으깬 과육으로 그린 것과 달리, 이번엔 본격적으로 붓을 들어 나한을 그렸다. 점을 한 번 찍고, 크고 작은 ‘무한대(∞)’를 각기 한 번씩 이어 한붓그리기를 하면 나한의 머리, 가슴, 가부좌 튼 다리가 완성된다. 수많은 나한이 모여 앉은 ‘무언가無言歌’의 정경은 화가의 눈빛처럼 따뜻하고도 심연한 것이었다.
매헌에서 만난 것들
화가로서 강미선의 원칙은 단순하다. 그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조급함을 물리치고 욕심을 덜어 내야 비로소 그릴 수 있다고 믿는다. 얼핏 소박하고 단출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호사스러운 생활일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눈앞에 있는 것만을 오래 응시한 뒤 화폭에 옮긴다. 아침에 붓을 들고, 어둠이 내리면 붓을 놓는다. 서울 통의동 골목에 자리한 작업실 문매헌은 강미선의 예술가적 자존과 일상의 풍치가 집약된 공간이다. 오랜 세월 그가 이어 온 ‘관심觀心’ 연작의 소재도 모두 이곳에 모여 있다.
문매헌의 소담한 마당에는 그 이름처럼 매화 몇 그루와 함께 모란, 토종 국화가 마당에 심겨 있다. 마당 뒷문에 놓인 싸리비는 유독 눈에 익다. ‘관심觀心-세심洗心’의 화폭에 담긴 바로 그 빗자루다. 강화도에서 가져온 연꽃과 10년 동안 기른 파초는 쌀쌀한 바람을 피해 실내로 들여놨는데, 이 역시 ‘관심觀心-연蓮’과 ‘관심觀心-파초芭蕉’의 모델이 된 바 있다. 그러고 보니 ‘무언가無言歌’ 작업에 쓴 땡감을 여름내 떨군 상서로운 감나무도 창밖에 우뚝 서 있다. 헐벗다시피 한 나뭇가지 위에는 까치밥으로 남겨 둔 열매 서너 개만이 매달렸다. 쓸쓸하고도 풍요롭다.
“감이 50개도 채 열리지 않더니, 지난가을엔 대풍이라 200개도 넘게 열렸을 거예요. 그걸 다 거둬들여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죠. 날짜도 기억해요. 10월 24일. 그날 감을 수확한 뒤에 그린 그림이 ‘관심觀心-감1’입니다.” 가로 4미터가 조금 안 되는 널찍한 화폭엔 감나무 가지가 커튼처럼 드리웠다. 한지와 먹의 담담한 빛깔은 안개처럼 아스라하고, 주홍색으로 한껏 영근 감은 당장이라도 손에 잡힐 듯 탐스럽다. 강미선은 이 감나무가 “달릴 것만 달려” 보기 좋았다고 했다. “감나무가 수묵의 소재로 쓰이는 것은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예요. 중국이나 일본에는 감나무 그림이 흔치 않은 데 비해, 우리 화단에서는 풍요로운 가을 풍경을 표현하고자 감나무를 즐겨 그리죠.” 그의 마음 한편에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애착이 단단히 자리한 듯했다.
수묵, 쓰며 그리며
강미선은 2021년 한 해 동안 쓰고 그린 것을 모아 <수묵(水墨), 쓰고 그리다>전을 연다. 수묵 안에서 쓰기와 그리기는 결국 하나라는 깨달음이 작품 곳곳에 묻어난다. 중국 원나라의 서화가 조맹부는 ‘서예와 그림에 근본적 차이가 없다’라는 ‘서화동원론’을 주장했다. 강미선은 그 사실을 아주 오래전 자연스레 체득했다. “유년 시절부터 서예를 시작했으니 이미 ‘쓰기’가 제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수묵을 전공하면서 자연히 쓰기와 그리기가 하나로 만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금강경>이나 두보, 상건의 시구가 들어 있는 강미선의 작품을 보고 뭇사람은 종종 “여기 쓰인 서체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고 했다. 글씨란 본디 상형(象形)이므로, 서체에 구애되기보다 그저 일보이배하는 마음으로 한 자씩 그려 가는 일이 중할 뿐이었다.
“‘제파산사후선원(題破山寺後禪院, 파산사 뒤의 선원)’이라는 작품에서 ‘담영공인심(潭影空人心, 못 그림자가 사람의 마음 비우네)’이란 시구를 발췌해 써 보았어요. 절간의 연못 한가운데 달 그림자가 내린 풍경을 묘사한 것이죠. 동양에서는 예부터 달을 맨눈에 담는 것이 아니라, 물이나 술잔에 괸 달을 보고 향유했답니다. 그런 은유적인 풍경이야말로 수묵의 근간이죠.” 오래 보아야 느낄 수 있는 은유적인 멋, 오랜 시간이 흘러도 닳지 않는 은은한 감흥. 강미선의 수묵엔 요즘 세상에 참 귀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그 속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다.
강미선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홍익대학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했다. 1985년 서울 관훈미술관에서 연 첫 개인전 이후 총 31회의 개인전을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제주, 중국 베이징·난징, 타이완 타이베이 등지에서 열었다. 2007년에는 중국 난징예술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며 수묵의 근원을 탐구했다. 강미선의 작품은 단순한 그리기를 넘어 바탕인 한지 표면에 질감을 부여해 독특한 조형성을 이룬다. 경주 남산의 선각육존불이나 서산 마애삼존불처럼 우툴두툴한 마티에르가 한국적 미감과 맞닿아 있다는 믿음에서다. 그는 오늘도 통의동의 작업실 문매헌에서 쓰고, 그리는 중이다.
〈수묵: 쓰고 그리다〉전
강미선은 한지와 먹의 물성을 즐겨 활용하는 작가다. 금호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초대전에서는 〈금강경〉 5149자를 담은 ‘금강경金剛經-지혜의 숲’을 포함해 최근 작품을 선보인다. 일상의 풍경과 사물을 담아내던 강미선의 시선은 이제 한시와 〈금강경〉으로 확장하고 있다. 전시는 2월 6일까지. 문의 02-720-5114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