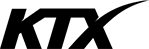만물이 계절을 탄다. 철 따라 태양의 열기, 바람의 결이 달라지듯이 나무에 달린 잎사귀 한 장도 색을 달리한다. 봄 가장자리에 여름이 맞닿은 이맘때의 빛깔은 어떨까? 이 계절의 정수를 느끼기 위해 충북 제천 옥순봉을 찾았다. 산자락 아래는 옥빛 물결이, 위로는 초록 잎새와 파란 하늘이 여행자를 맞이했다.
눈부신 제철, 제천에 닿다
호흡으로 절기를 포착할 수 있다. 들숨에 습한 듯 무거운 열기가 코를 간질이기 시작하는 초여름, 기차를 타고 제천역에 도착했다. 승강장 맞은편 정경은 소박하다. 역을 둘러싼 나직한 가게 사이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간다. 정감 가는 모습 위로 달콤한 꽃향기가 바람 타고 실려 온다.
제천역에서 나와 옥순봉으로 향한다. 남한강 변에 우뚝 솟은 희고 푸른 아름다운 바위들이 마치 대나무 싹과 같다 하여 퇴계 이황이 옥순봉이라 이름을 붙였다. 일찍이 절경으로 알려져 옛 글과 그림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림 속 옥순봉의 모습은 주로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본 형세다. 선비들이 우러러본 옛 자태와 현재의 광경을 아울러 감상하기 위해 이번엔 배를 타기로 했다.
광활하게 펼쳐진 청풍호 초록색 수면 위로 산과 하늘이 비친다.
퇴계 이황, 단원 김홍도가 그랬듯 글과 그림으로 읊고 싶은 풍경이다.
유람선 선착장에 들어서자 청풍호가 광활하게 펼쳐진다. 잔잔한 초록색 수면 위로 산과 하늘이 비친다. 완벽한 대칭이 데칼코마니로 채운 화폭 같다. 뱃놀이하기에 알맞은 날씨다. 여행에 제철은 없다지만, 그 순간에만 만나는 풍광이 있기 마련이다. 청풍호는 1985년 남한강에 충주댐을 건설하면서 조성됐다. 충주에서는 충주호, 단양에서는 단양호, 제천에서는 청풍호로 불러 지역마다 명칭이 다른데, 충북 제천·단양·충주 세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제천에서는 청풍면에서 이름을 가져와 청풍호라 한다.
뱃고동 소리가 귓전을 울린다. 여행객을 태운 유람선이 청풍나루에서 출발해 단양 장회나루에 갔다 돌아오는 1시간 30분의 여정을 시작한다. 고요하게 반짝이던 옥빛 격자무늬 물결이 일그러지고, 새하얀 포말이 뱃길을 따라온다. 육중한 배의 하체가 수면을 찰방찰방 가르며 작은 물방울을 흩뿌린다. 연달아 나타나는 봉우리가 싱그럽고, 연한 잎사귀들은 살랑살랑 일렁인다. 산과 산 사이로 드문드문 집과 밭이, 마을이 보인다. 배는 유유히 물을 헤치고 나아간다. 지나쳐 가는 산과 절벽조차 명승지 같다. 암석이 이룬 작은 군락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 주고 싶다.
넉넉한 청풍호, 그 안에 담긴 역사
피부에 닿는 공기가 미지근하다. 뜨거운 태양에 찬 기운이 녹아서일 것이다. 맞바람에 눈 뜨기가 어려워도 경치 하나하나 담고 싶어 연신 눈을 비빈다. 한참 물길을 달리니 빨간 교량이 보인다. 옥순대교다. 현재 청풍호를 보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본래 이 위치에는 나루터가 자리했다. 댐 건설로 일대가 물에 잠기기 이전에 강과 마을이 있던 시절의 이야기다. 수산면 괴곡리와 맞은편 상천리 사람들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오갔다. 총 5개 면의 61개 마을이 물 밑으로 사라졌다. 학교와 집이 잠겼고 각 마을의 별명과 수호신도 기억과 기록으로만 남았다.
청풍호가 품은 사연을 생각하며 잠시 묵념한다.
배가 옥순대교를 통과하자 옥순봉이 위용을 드러낸다. 세로로 쩍쩍 갈라진 기암절벽 사이로 푸른 나무가 구름처럼 걸렸다. 보물로 지정된 단원 김홍도의 <김홍도 필 병진년 화첩> 중 ‘옥순봉도’와 똑 닮았다. 우러러보는 각도 하며, 쭉쭉 뻗은 암석들이 붙은 듯 떨어져 있는 모양새가 지금도 동일하다. 푸른색과 흰색이 섞인 암석에서 옥빛이 나니 옥순봉이란 이름이 맞춤하다. 다만 퇴계 이황의 흔적을 볼 수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조선 명종 3년 단양군수로 부임한 퇴계는 절경에 반해 청풍군수에게 옥순봉을 넘겨 달라 청했다가 거절당한다. 못내 서운했던 퇴계는 옥순봉 암벽에 단양의 관문이라는 뜻의 ‘단구동문’을 새겼다 전한다. 거대한 돌기둥 밑동은 댐 건설로 물에 잠겼지만, 옥순봉은 여전히 웅장하다.
가은산에 다다른다. 시원하게 쭉쭉 뻗은 옥순봉과는 또 다른 분위기다. 개성 넘치는 기암괴석에 붙은 코끼리바위, 촛대바위, 물개바위 등의 이름이 재미있다. 가은산의 하이라이트는 새바위다. 모양이 새 같기도 하고 얼핏 다람쥐 같기도 한데, 손으로 빚은 듯 정교하다.
옥순봉과 눈 맞추기
뱃길을 따라 옥순봉을 우러러봤으니, 이제 다른 얼굴을 볼 차례다. 출렁다리에 올라 옥순봉과 눈높이를 맞춰 본다. 222미터 길이의 다리는 봉과 봉 사이에 아찔하게 걸려 있다. 겁이 났으나 용기를 낸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진동이 인다. 다른 통행자가 지나가자 흔들림이 배가된다.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시야를 멀리 두는 것이다. 불과 100미터 남짓한 거리에 있는 옥순봉에 시선을 둔다. 호수에서 올려다볼 때는 발견하지 못한 옥순봉의 옆얼굴을 맞닥뜨린다. 암석의 기개가 드러난 정면과 달리 측면은 나무가 더욱 잘 보인다. 닿을 듯 가까운 암석 위로 나무 하나하나 명도 차이가 느껴진다. 어느새 다리 밑 아찔한 호수는 잊고, 관조하기에 이른다. 출렁다리 끝에서 되돌아오는 길엔 한층 용감해져 아까 못 들은 새소리와 바람 소리도 들린다. 경치에 녹아들었기 때문이리라.
시야를 멀리 호수로, 굽이치는 능선으로 옮긴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도 결국 자연만은 그 자리에 있다. 옛 선비도, 지금은 수몰된 지역의 실향민도 모두 이 풍경 속에 머물렀다. 옥순봉의 지층을 이루는 것은 곡절 많은 사연인지도 모른다. 옥순봉은 오늘도 켜켜이 제천의 기억을 쌓아 간다.
<KTX매거진>의 모든 기사의 사진과 텍스트는 상업적인 용도로 일부 혹은 전체를 무단 전재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걸거나 SNS 퍼가기 버튼으로 공유해주세요.
KEYWORD